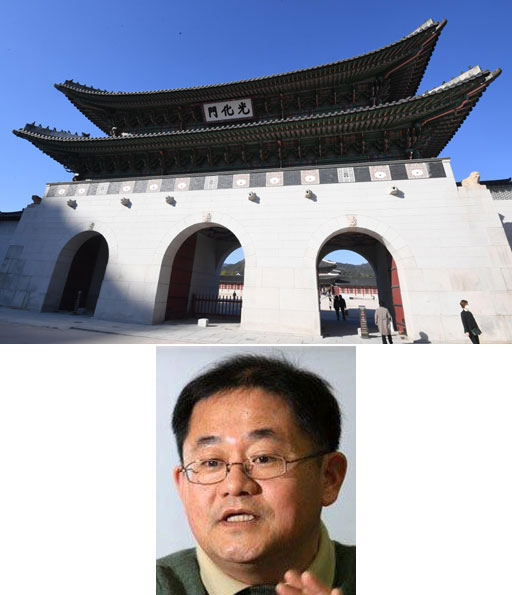
조선시대 정치의 화두는 바로 '공론'
율곡에겐 일반인들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나 위정자 인식은 '삼사의 결정'
백성이 느끼는 1차적인 감정 '민정'
현실 정치가 가져온 그대로의 모습
민정 외면 인심에 경도된 결과 '붕당'
현대 정치학의 화두가 '민주주의'라면 조선조, 특히 율곡 시기 정치의 화두는 바로 '공론'이었다. 문제는 이들 말 속에 등장하는 공론의 의미다. 율곡에게 공론은 일반인[國人]들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여정(輿情)으로, 모든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의 위정자들이 인식하는 공론은 바로 삼사(三司: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결정이었다.
의논이란 말은 '의(議)'와 '론()'의 합성어다. '론'은 결과지향적인 결론에 가까운 의미가 되며, '의'는 그 과정에 가까운 것이다. '론'이 혼자서 결단하는 것이라면, '의'는 여럿이 함께 구체적인 사안들을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론'을 강조하다 보면 '시비(是非)'의 문제, 이념의 문제를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정(議政)'은 '논정(政)'으로 바뀌고 만다. 조선 정치 시스템에서 가장 돋보이는 '의정부(議政府)'는 문자 그대로 '정치를 의논하는 기구'였다. 하지만 의(議) 기능을 상실한 의정부가 '론(論)정부'화된 상황에서 율곡은 '의'를 살려냄으로써 정치의 장에서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했다.
소통의 핵심은 '논'의 우월성으로부터 '의'의 우선성을 지키려는 인간의 정치적 노력이다. 율곡이 공론을 강조한 것은 당시의 잘못된 공론인식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즉 언로를 독점하고 만장일치만을 지향하는 당시 삼사의 잘못된 풍토와 여기서 발생한 소통의 단절이라는 폐해를 비판했던 것이다.
율곡은 '민정(民情)'을 중시했다. 율곡이 선조에게 폐법과 폐정을 개혁하자고 주문하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바로 '민정이 모두 원하는 바[民情皆願]'였다. 민정이란 일반 백성들이 느끼는 1차적 감정으로 인간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정자의 1차적 책임은 바로 민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민정은 민의(民意)와는 다르다. 민의는 왜곡될 수 있지만, 민정은 그 자체가 바로 현실정치에 대하여 느끼는 가장 솔직한 감정이다. 민의는 잘못 갈 수도 있지만, 민정은 그 자체가 바로 현실 정치가 가져온 그대로의 모습이다.
민정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백성의 소리를 직접 다 들을 수는 없다. 따라서 백성의 소리를 듣기 위한 매개자가 필요하다. 그 매개자의 일은 '민정'을 잘 파악한 후 그 민정을 중앙에 전달하는 것이다.
민정에 상대되는 정치적 용어는 인심(人心)이다. 인심이란 용어를 율곡은 한 번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유는 바로 인심을 강조하면 민정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조의 붕당은 민정을 외면하고 인심에 경도된 결과다. 정치의 장에서 가장 상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론'이란 영역이 민생을 외면하고 인심이라는 일반론에 경도될 때 공론(公論)은 시론(時論)으로 머물다가 마침내 공론(空論)화 된 것이 조선의 붕당이라고 율곡은 본 것이다.
율곡에게는 두 개의 근본이 있었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지만 정치의 근본은 임금이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선조는 정치의 근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낯설어했다. 선조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자신의 소극적인 자세를 변명한다. 학문을 쌓아 덕행이 완성된 다음에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선조의 주장이었다. 선조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원칙적인 자세를 율곡은 반박했다.
율곡은 군주(君主)의 수신(修身)을 중요하게 인식했지만, 군주가 수신이 될 때까지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정치가 갖는 속성임을 주목했다. '수신'을 윤리적이며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입장이 확장되면 '준비론'으로 흐르게 돼 결국에는 군주의 수신이 완성될 때까지 정치는 뇌사 상태로 놓이게 되고, 마침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율곡은 인식하고 있었다.
나라의 근본인 민이 정치적으로 목적이 되지 못하고 도구로 전락된 상태가 바로 율곡의 시기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율곡에 의하면 바로 '만남'이다. 즉, 나라의 근본인 백성과 정치의 근본인 임금과의 만남이다. 그런데 백성과 임금이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기보다는 오히려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금과 백성을 만나게 해 줄 매개자가 필요하다. 그 매개자 집단이 바로 신료(臣僚)라고 할 수 있다. 신료들이 '민정'을 잘 매개하면 정치의 장이 활성화된다. 결국 임금과 신하 간의 만남이 정치의 장에서 소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율곡은 우리 역사에서 바람직한 군신 간의 만남을 찾아봤고, 마침내 세종대왕의 인사행위를 선조에게 소개했다. 율곡이 선조에게 추천한 세종의 인사정책은 첫째는 '초천(超遷)·구임(久任)의 법'이었고, 둘째는 '관(官)과 작(爵)의 활용'이었다.
율곡에게 정치란 '정(政)을 행함으로써 치(治)를 이룩하는 것'이다. '정'은 현실세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가리키는 반면, '치'는 그 행위가 바람직한 상태로 나타난 결과를 가리킨다. 율곡은 '정'은 위정자들의 행위 여부에 따라 '정치(政治),' '정천(政擅),' 그리고 '정산(政散)'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이것이 현실에서는 다시 '안(安), 위(危), 난(亂)'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율곡에게 정치란 '위험과 혼란이 아닌 편안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천단[政擅]되거나, 사라지지[政散] 않고 제대로 다스려진[政治] 상태'를 가리킨다.
율곡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國] 그 자체가 아니라 '나라가 되는 것[爲國]', 달리 말하면 '과정'이었다.
그러한 율곡의 사고는 '공동체 그 자체'보다는 '공동체 되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삼대나 요순시대와 같은 '무엇[What]'의 차원이 아니라 '삼대 되기, 요순시대 되기'라는 '방법[How]'의 차원이었다.
최진홍 서경대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