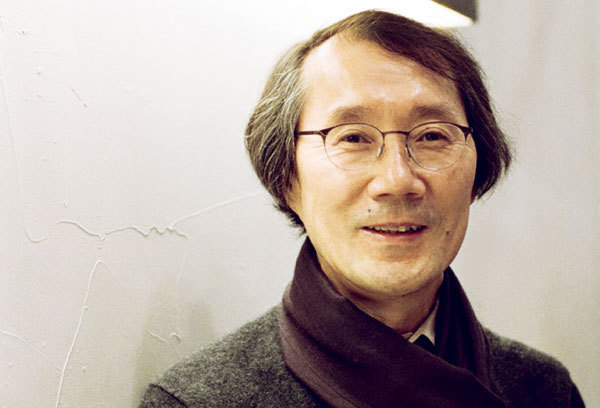
어스름 저녁 산책길. 매미 소리가 들린다. 귀 기울여 들으니 점점 소리가 커진다. 합창을 하는 듯하다. 매미가 이렇게 요란을 떠는 것으로 보아 오란비가 끝나려나 보다. 옛사람들은 장마를 오란비라고 불렀다. 오란비는 오랜비일 것이다. 한자어로는 림(霖)이라고 표현하는 오란비에서의 오란은 장마의 장(長)과 통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비에 대응하는 마는 토착어인가 한자어인가?
첨단 장비를 갖춘 기상청도 천기(天氣)를 옳게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옛날의 일기 예측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그럼에도 관상감(觀象監)은 별자리를 살펴 천문(天文)을 해석해야 했다. 조선 인조 3년(1625년)의 ‘승정원일기’ 속잡록은 9월에 태백성(太白星)이 하늘을 가로질렀다고 기록했다. 이에 근거해 조정은 선조(1567~1608년)의 일곱 번째 아들로 번번이 역적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을 강릉으로 좌천시킨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인조 6년(1628년) 1월 역모혐의로 진도에 유배됐다가 5월14일 사사된다. 인간의 삶은 이렇듯 철저히 객관적이지 않은 미신과 편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의 지식은 진정 허술하고 부정확하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무한대의 상상력이 지식의 모자람을 보완한다.
우리 어머니는 장독대 주변에 심은 분꽃이 일찌감치 잠을 자려고 꽃잎을 오므리면 저녁밥 지을 때임을 아셨다고 했다. 느슨하지만 과히 틀리지 않는 삶의 지혜다. 전승된 경험의 노를 저으며 삶이라는 고해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위대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지혜가 모여 위대한 지구 문명을 이룩했다.
어쩌다 밥을 지을 때 나는 손대중으로 밥물을 가늠한다. 얕은 개울을 건널 때는 눈대중으로 거리를 가늠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가늠으로 점철된다. 삶 자체가 가늠의 연속이다. 가늠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이런 가늠의 경험이 삶을 이끌어 가는 지혜가 된다. 정신적 위기에 처한 내게 들려준 띠 동갑 지인의 말 한 마디는 요동치던 내 심장에 안정제 이상의 위안을 주었다. “눈 올 때 마당 쓸지 마라.” 아픈 경험의 소산이 아닐 수 없는 진언(眞言)이다.
성하(盛夏)에 목청 높이는 매미는 과연 우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도 없이, 이야기책들이 매미의 울음소리라고 하니까 세상을 달리 볼 생각을 못 했다. 자주적으로 사유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세상에 난무하는 실효 없는 지식만으로 세상의 온갖 물상과 사람을 재단해 왔다. 매미 소리를 울음으로 규정하는 것이 그 한 예다.
사실 우리가 매미의 울음이라고 말하는 소리는 과학적으로 볼 때 날개가 부딪쳐서 나는 소리 현상에 불과하다. 이를 매미가 운다고 말해야 할 필연성은 없다. 웃음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환희의 찬가로 들릴 때도 있다. 새는 노래한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모든 새가 노래하란 법이 없고, 새도 때로는 슬피 울고 싶은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식의 편향성에 깊이 물들어 있다. 교육은 속박된 인식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거듭 말해 사람은 상상력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 그래야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다고 나는 믿는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매미의 날개 떨림을 그려보았다. 며칠 전 강릉역에서 벌인 탱고 플래시 몹과 라틴 댄스 공연에 참가했던 댄서들의 열정적인 몸놀림 소리가 오버랩되었다. 인간의 눈에는 턱없이 짧은 매미의 일생도 매미에게는 스스로 기쁨의 춤을 춰야 할 만큼 길고 멋진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매미의 삶도, 여린 초본(草本)의 삶도, 우리의 삶도 두둥실 춤출 만큼 기쁘고 아름다운 것이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