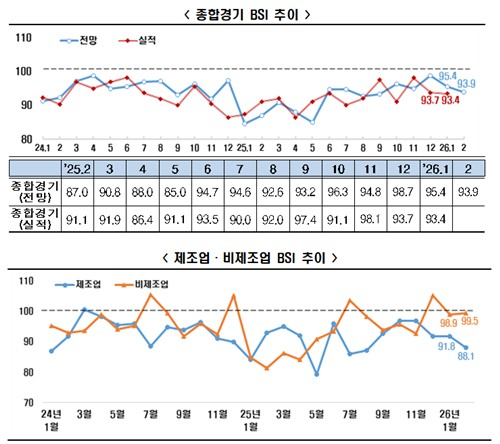초(超)연결 사회다. 모바일 혁명이 가져온 결과다. 2011년 서울디지털포럼에서 미국 방송 래리 킹 라이브의 진행자였던 래리 킹은 이렇게 강조했다. 모바일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혁명기를 맞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손끝 하나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긴밀하게 인간과 연결돼 있다. 초연결 사회를 이끌어낸 조력자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 스마트폰은 '제2의 뇌'로 통한다. 지식적인 부분은 물론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인간의 삶을 더 똑똑하게 해주었다. 한편으론 그러한 똑똑한 기능들로 인해 기기를 손에서 떼기 힘든 중독이라는 부작용도 일어난다. 스마트폰이 많은 여유와 시간을 가져다 준 게 사실이나 사람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집중하게 됐다. 스스로 자제해야 함을 알면서도 이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졌다.
▼ '스마트폰 과부, 스마트폰 홀아비'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진 청소년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의 강한 자극에 노출된 어린이는 현실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력이 크게 떨어진다. '팝콘 브레인'이다. 우측 전두엽 활동이 저하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중독성을 가진 어린이는 깜빡거리는 불빛에 맞춰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도록 한 실험에서 일반 어린이보다 훨씬 빠르거나 무척 느리게 행동했다.
▼ 중독자들은 스마트폰을 늘 손에 쥐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 중에는 타인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심하면 가족, 친구 간의 소통이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소통의 도구에서 출발한 스마트폰이 오히려 소통을 차단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에는 인간이 기술의 주인이고 컴퓨터가 종이었다면 지금은 주종 관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구에 의해 인간이 지배되는 현실, 스마트 시대의 아이러니다.
장기영논설위원·kyjang3276@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