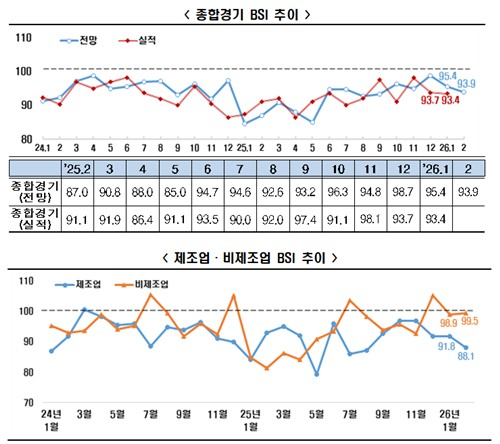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1년 전 광화문을 가득 메운, 백만이 훌쩍 넘는 시민들의 뜨거웠던 열망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다. 촛불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불법시위, 집회, 시민혁명, 항쟁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1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날, 태극기 집회도 함께 열렸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소승은 촛불을 '평화혁명'이라 부르고 싶다. 무엇보다 '평화'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세계 언론이 주목한 것도 '평화'였다. 경찰버스에 돌을 던지는 대신 꽃을 붙이던 모습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민족의 본성이 아닌가 싶다.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은 탄핵과 사법처리의 길을 밟아야 했고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졌다.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이뤄낸 것이다.
이는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혁명'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 같은 평화혁명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피로 얼룩진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촛불이라는 평화혁명을 만들어낸 것이다.
내년은 동학혁명(東學革命) 123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동학혁명은 농민봉기, 농민운동 등으로 의미가 축소됐었다.
전라도 고부에서 일어난 지역 차원의 사건으로 격하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학혁명이 추구했던 사회개혁의 의미가 재평가되고 있다. 전봉준이 제시한 14개 항에 이르는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은 당시 사회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요구했다.
전봉준은 처음부터 폐정개혁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고 전주 감영을 격파한 후 공주를 거쳐 목적지를 서울로 잡았다. 그러나 그는 공주 우금치 전투 등에서 패배, 끝내 개혁 의지를 접어야 했다. 역사는 돌고 돈다. 과거의 경험을 되새겨 오늘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동학혁명은 갑오년(甲午年·1894년)에 일어났다. 육십갑자(六十甲子) 후인 1954년 갑오년에는 4·19의 단초가 된 이승만 자유당의 '사사오입(四捨五入)'이 있었다.
두회갑자(二回甲子) 후인 2014년 갑오년에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씨앗이 된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세 가지 사건 모두 국권찬탈, 4·19혁명, 촛불 평화혁명으로 이어졌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그래서 '세월호' 참사를 국정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면 지금과 같은 처참한 몰락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제 아무리 서슬 퍼런 권력이라도 민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 개혁에 대한 민의는 저 깊은 땅 속의 용암과도 같아서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부글부글 끓고 있기 마련이다.
동학혁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역사학자들이 동학을 이끌던 전봉준 등 지도자 5명이 서울 종로의 종각 맞은편에 있던 전옥서(典獄署)에서 처형된 것을 기려 그곳에 전봉준 동상을 세우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마침 그곳은 촛불 평화혁명이 일어난 광화문 부근이다. 두회갑자 사이에 일어난 사건의 역사적 만남이다. 다시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역사적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