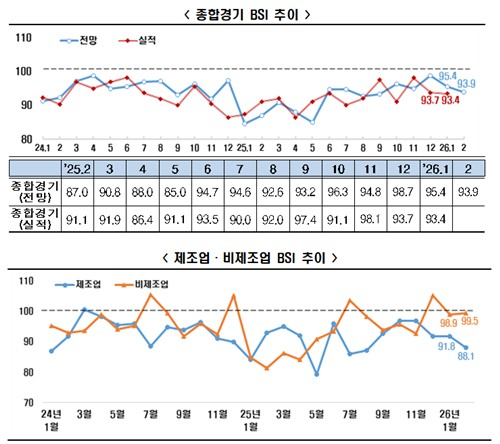정부, 새해엔 구구한 변명보다 민생 살리기 올인을
무지개만 그리는 공허한 '말잔치' 공감 못 얻어
국민은 현실에 기반한 유능한 '국정'을 더 원해
“1년 360일은 정월 초하룻날에 시간을 보면, 무한한 세월이 있고 무한한 경계가 있어 아득히 멀게 만 느껴지니, 그 사이 무한한 공부와 무한한 사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곧장 넉넉하게 한두 시간을 보내고 하루 이틀 더 보내더라도 아직 많은 세월과 경계가 있어 일하기에 여유가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이 때문에 여유만만하고 기세등등해 새벽에 할 일을 아침으로 미루고 아침에 할 일을 낮으로 미룬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을 다시 그다음 날로 미룬다. 그저 미루는 일만 끊임없이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날이 가고 달이 가며 봄이 가고 가을이 오게 된다. 어느새 곧바로 섣달그믐날이 온다. 뒤돌아보면 지나간 세월과 경계가 눈 깜빡할 사이처럼 느껴지지만, 어떠한 공부나 자잘한 사업도 이뤄 놓은 것이 없다.” 조선 말 주자학자이며 독립투사였던 곽종석(郭鍾錫) 선생이 1873년 섣달그믐에 '제석잡화(除夕雜話)'라는 글을 지어 한 해를 돌아봤다. 뜨끔한 말이 많다.
계층·세대·지역갈등 해소를
벌써 한 해가 저물어 새해를 맞았다. 2020년 대한민국에는 전방위 악재가 쏟아졌을 뿐 국가적 경사라고 할 만한 일이 없었다. 코로나19 감염 공포, 분노할 힘조차 앗아가 버린 미친 집값에 24번이나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국민을 혼동케 하더니 툭툭 던지는 지도층 인사들의 언사는 서민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과속 질주하는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 이로 인해 국민은 계층-세대-지역갈등으로 분열됐다. 한마디로 2020년 국민 삶은 팍팍하기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기업에는 혁신과 투자를, 노동계를 향해서는 양보와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공정은 담보되고 있는가. 대학교수단체가 발행하는 주간지 '교수신문'은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20일 발표된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다.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뜻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자어로 옮긴 신조어라는데, 유래야 어떻든 부정적이기는 매한가지다.
청년들, 취업 포기자로 전락
또 경제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은 여전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졌고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전문대·대학을 졸업한 25~39세 청년 가운데 3.7%인 29만명이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 없는 '취업 무경험자'라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 중 일부는 '공시족' 등 장기 취업준비생이 됐다가 결국 취업 포기자로 전락하곤 했다. 일본 거품 붕괴 시기 '잃어버린 세대'의 한국판이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화두는 너무 상투적인 메시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답답한 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의 끈질긴 '낙관론'은 현 상황을 '올바른 나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쯤으로 여기는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새해를 맞은 국민은 이제 무지개만 그리는 공허한 '말잔치'보다 현실에 기반한 유능한 '국정'을 더 절실히 원한다는 점이다. 구구한 변명으론 정국을 돌파할 수 없다. 그저 주저앉을 뿐이다. 맞고 깨지고 터진 곳은 부풀어 오르고 멍이 들게 마련이다. 그 멍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듯이 실패도, 패배도 변명으로 감춰지지 않는다. 졌으면 깨끗이 졌다고 해야 진짜 다시 기적같이 이길 수 있다.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날마다 기적이었다. 무슨 기적이냐고 반문할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로 힘들어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도 기적이다. 기적 같았던 지난 한 해를 끈질기게 버텨 보냈으니 2021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