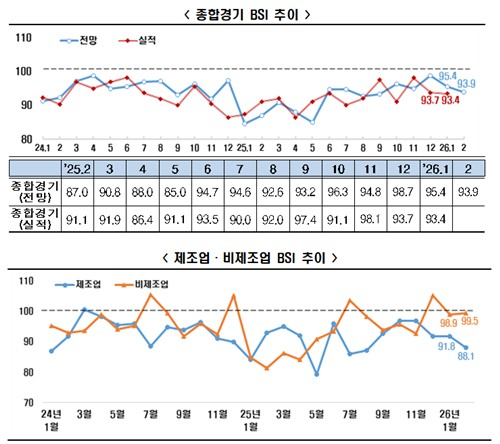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코로나19로 무대를 잃어버렸을 때 참 힘들었다. 그래서 요즘 무대에 설 때마다 모든 연주가 더 소중하고 감사하다. 살아 있는 기분이다.”
오는 24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교향악축제 폐막무대 공연을 앞두고 있는 춘천 출신 피아니스트 조재혁(52)은 무대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바쁜 와중에도 20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그는 “음악가는 불러주시는 곳이 있고 무대가 있어야 살아난다. 옛 작곡가들이 만든 곡도 살고 저희 목소리, 존재감도 살아난다”며 감사함부터 전했다.
지난 18일 그의 두 번째 피아노 앨범이자 6번째 음반인 ‘발라드'에 대해 질문하자 조 피아니스트는 “보통 음반작업을 하면 나오는 시간까지 1년이 걸리는데, 모든 것이 다 그랬듯 코로나19 때문에 정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음반에는 그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쇼팽의 네 개의 발라드와 피아노 소나타 3번이 수록됐다. 그는 자신의 원숙도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그는 “쇼팽은 작곡가로서 독보적이다. 하지만 쇼팽 음악은 감미롭고 듣기 좋지만 어렵다. 그래서 내가 한 녹음을 다시 들으면 괴롭다. 아쉽거나 놓친 점만 부각돼서 들린다. 그럼에도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예술작업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조 피아니스트의 이 같은 피아노에 대한 열정은 춘천 동부시장 내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생겨났다.
이 무렵부터 취미 삼아 피아노에 관심을 보인 그는 소양중 시절, 전국 틴에이저 콩쿠르 골드상, 한국일보 콩쿠르 1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예고에 수석 입학한 이후 1년 만에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다. 회의감을 느끼고 변호사가 될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음악으로 돌아왔다. 뉴욕을 주무대로 활동하던 중 2010년 성신여대 교수로 초빙됐고 한국에서 부인을 만나며 한국에 정착했다.
조 피아니스트는 “까맣고 하얀 것이 나열돼 있는데 소리가 나는 게 신기했고, 그 안에 복잡한 기계로 보이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오르간 연주도 시작했고, 코로나19 시국에는 두달간 하루 12시간씩 투자해 오르간을 직접 만들었다”며 웃었다.
오랜만에 서는 무대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는 음반 발매를 기념해 29일부터는 제주, 천안, 진주, 여수, 서울, 울산, 전주, 부모님이 머물고 계신 강릉(6월18일) 등에서 전국 투어를 갖는다. 이어 다음 달 21일 대관령음악제 연중공연 일환으로 평창에서 청중과 소통하고 토크를 곁들인 콘서트를 펼친다. 6월에는 영국 런던 카도간홀에서 독주회를 갖고 베토벤 페스티벌 일환으로 무대에 오른다.
그의 꿈이 궁금했다. “메나헴 프레슬러(98)라는 피아니스트가 무대를 갖는 걸 접한 적이 있다. 육체적으로는 노쇠할지 모르나 그 안에 품은 예술이 진한 감동이었다. 나 역시 계속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옆에 두고,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음악과 청중과 함께 살고 싶다.”
이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