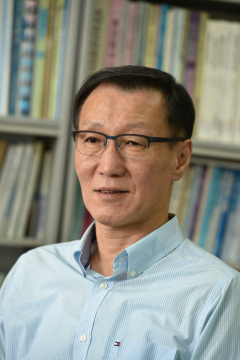
6·1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강원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가 선출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은 이광재 후보를 등 떠밀어서 내보낸 모양새다. 중앙당과 도내 시장·군수 후보, 도의원 후보들의 출마해 달라는 요청에 못 이겨 출마하는 것 같았다. 마치 영화 친구에서 동수(장동건 분)가 준석(유오성 분)에게 “니가 가라 하와이”라고 하듯이. 그리고 마침내 지사 선거 출마는 하지 않겠다던 이 후보가 다시 등판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도지사 공천에서 김진태 후보의 ‘컷 오프'를 결정했다. 하지만 과거 5·18 및 불교계 관련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에 곧바로 사과가 이어졌다. 그리고 기사회생한 김 후보가 경선에서 이겨 최종 주자로 나서게 됐다. 오락가락한 공천에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다.
춘천, 원주, 강릉 등 이른바 도내 빅3 지역도 후보 공천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어수선한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오랜 기간 시장 출마를 꿈꿨던 후보가 당의 공천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며 자진 사퇴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컷 오프(공천배제)된 후보들이 잇따라 억울하다고 재심 신청을 했다. 간신히 각 당의 경선 후보들이 확정됐지만 떨떠름한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중앙당의 공천기구가 공천에 직접 관여하는 ‘전략공천'과 ‘전략선거구'가 이번 단체장 선거처럼 많은 적도 없다. 그만큼 강원도가 중요하다고 치장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방선거가 아닌 중앙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이다. 그동안 대권 놀음에 정신이 팔렸던 양당이 이번에는 지방자치에서 칼춤을 추며 근간을 흔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앙정치 예속화, 줄서기, 패거리 정치 등을 강요하며 많은 폐해와 잡음을 낳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건 막상 선거일이 되면 손가락은 딴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현실이다. 죽어라 하고 욕을 하던 정당 공천 후보에 표를 몰아 준다. 왜 그럴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권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평소엔 지역을 무시하는 정당에 욕을 퍼부으면서도 선거에선 표를 주고 있다. 이는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위협과 공포로 인해 인질범을 사랑하게 된다는 ‘스톡홀름 신드롬'이 아닌가. 이래서는 진정한 주민자치는 요원하다. 지방선거에서 갈수록 정당 공천이 중요해지는 만큼 주민자치는 물거품이 되고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끌려다니는 상황은 반복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지선은 대선의 연장선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는 희석되고 편 가르기가 심해져 주민 화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
언제부터 중앙정치의 ‘윤심(尹心)'과 ‘명심(明心)'이 지방선거판을 뒤흔들었는가. 그러니 주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난망(難望)할 수밖에 없다. 후보 공천부터 유권자 의식까지 뿌리째 바뀌어야 지방자치도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권력만 좇는 정치가 아니라 민의를 떠받드는 정치는 지역이라는 토양에서 싹을 틔우고 길러진다.
2014년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에서 ‘지지 정당 없음당'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당 이름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지방선거판이라면 이런 이름의 정당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정치 혐오증'은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심하다. 그 ‘정치 혐오증'이 지방선거까지 확산된다면 그보다 심각한 일은 없다. 중앙정치에 깊이 예속되고 있는 지역 정치의 현주소를 바라보며 독립과 부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권을 온전히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진정한 정치 혁신과 개혁을 바란다면 그 시작은 지방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