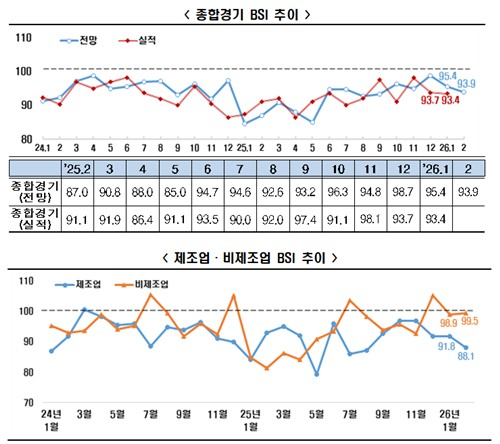오픈AI가 작년 12월에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가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각종 언론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사전에 훈련된 생성형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뜻한다. 챗GPT는 컴퓨터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사용자의 질문에 잘 정리된 문장으로 대답하도록 설계된 생성형 AI 서비스의 하나다. 챗GPT는 출시 2개월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명을 넘겼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시대임을 각인시켜준 2016년 알파고 이후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제한된 서비스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챗GPT는 인공지능 기술을 일반사용자가 자기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획기적인 서비스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AI 기술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출시되었지만 챗GPT만큼 파급력이 큰 것은 없다.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챗GPT는 수백만 개의 웹페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에 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 이후의 최근 지식은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적절한 질문이나 차별적이고 혐오스러운 질문을 배제하기 위해 사람이 일일이 웹페이지를 사전에 검토하였고, 프로그램 자체를 사람이 만들었기에 챗GPT의 답변에는 사람의 실수와 편견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는 앞으로 인터넷의 중심에 자리하면서 일상생활과 일터의 환경을 크게 바꾸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대 투자자인 오픈AI가 내놓은 서비스인데, 이에 대항하여 구글이 바드(Bard)라는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2월에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중에 세계 최대 한국어 기반 언어모델인 서치GPT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카카오브레인도 KoGPT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대전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세한 모양새다.
챗GPT가 촉발한 AI 산업 경쟁과 사회 변화의 파도가 거센 만큼 생성형 AI 서비스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또한 시급하다.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의 생성, 학생이나 연구자의 논문이나 과제의 대필,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인정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작년 말에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6월까지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플랫폼 기술개발과 서비스의 활용이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에 시작된 인공지능(AI) 발전의 역사를 돌아보면 두 번의 봄과 겨울을 거쳐 2010년대 들어와 세 번째 봄날을 맞고 있다. AI 기술 발전과 컴퓨팅 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이 뒷받침하고 있는 세 번째 AI의 봄은 쇠퇴하지 않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어느덧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왔다. 디지털 시대의 춘천은 디지털의 봄이 먼저 오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 챗GPT가 선도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춘천의 학계, 연구계, 기업,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시민들도 이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