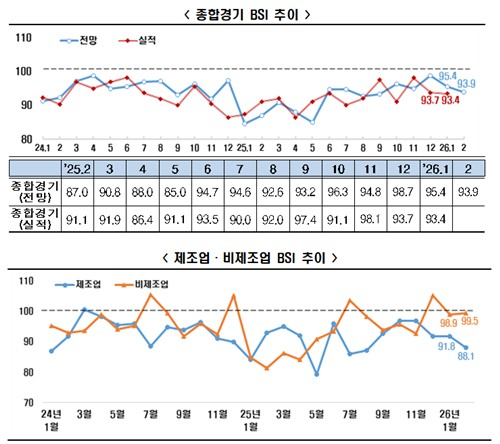정부가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지도층 비리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11월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의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팀이 대검찰청에 구성된다. 특히 대통령이 ‘공직사회 다잡기’에 발 벗고 나선 것 자체가 드문 일이다. 대통령이 나서야 될 정도로 우리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졌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오늘의 한국사회가 있기까지 공무원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무원들이 일반 직장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들의 업무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체의 행동에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정책의 판단과 집행에 공개념이 필수적인 것이다.
물론 일부 공직자들이 비리로 국민의 비난을 받는 일이 있었으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 기강확립은 단골 메뉴 중의 하나다. 과거에는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는다는 구실로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기대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공직기강 바로잡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내부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자칫 타성에 이끌리기 쉬운 공직사회에 대통령이 앞장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효과가 클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 변화는 외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것보다 내부 역동성에 의한 것이 더 바람직하다. 뇌물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게 하고 충분히 보상해 주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공복의식이 회복된다. 또 행정적으로 상급자의 관리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해 비리의 구조적 토양을 바꿔야 한다. 일부이지만 공직사회의 부패 뿌리가 워낙 깊어 총체적 노력 없이는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설
[사설]개혁은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