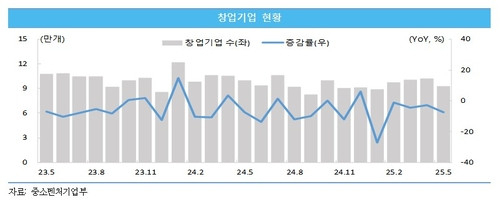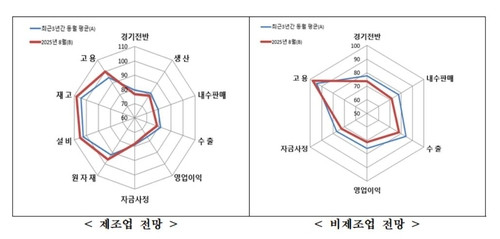1970년대, 치수(治水)의 가장 큰 목적은 홍수를 막는 일이었다.
하천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물길을 일자로 펴고 하천 양쪽에는 콘크리트로 높은 제방을 쌓았다.
친수(親水)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다. 하천변을 따라 생긴 자전거 도로와 공원, 산책로가 그것들이다.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옛날 멱 감고, 물고기 잡던 때의 생태로는 복원되지 않았다.
하천의 자연성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홍수를 막으면서도 자연의 상태, 자연의 흐름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형 하천 또는 생태하천 정비사업이다.
춘천의 도심 하천인 공지천은 몇 해 전만 해도 홍수와 건천이 반복되고 도시화로 수질오염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하천이었다. 재해를 막으면서도 하천 생태계를 최대한 복원하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04년이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일부 구간을 정비하는데 그쳤다.
다행히 올해 들어 대규모 국비지원을 받아 최대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손을 대면 앞으로 다시 공사를 벌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구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게 해야 했다.
이번 사업은 생태계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 재해예방 정비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물길을 막고 있는 상류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자연석으로 교체된다. 경사면과 둔치에는 야생화가 피는 식생 매트가 설치된다. 물길을 따라 여울, 징검다리, 생태습지와 저류지가 만들어진다. 현재의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도 더 확장된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지천의 수질과 생태를 예전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1970년대 우악스럽게 시공된 인공 구조물을 가능한 한 헐어내야 한다. 이 사업은 수차례의 토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하천관리계획과 설계 기준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가 자신의 의견이 전부인 양 담당 공무원의 무지와 오만, 독선, 예산낭비라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다. 무지와 오만, 독선이란 말은 그분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지역의 상징인 공지천을 전국 최고의 자연형 도심 하천으로 만들고 싶고, 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종구 춘천시 하천관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