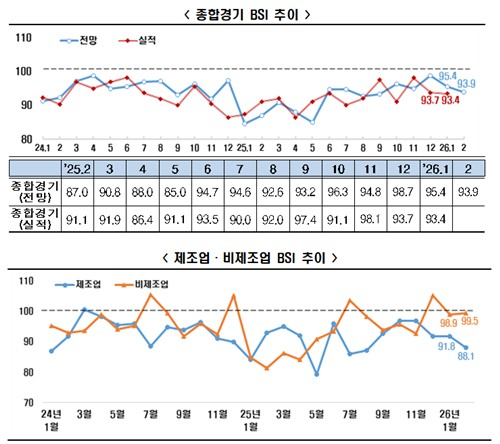한강 수질보전 시설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맑은 물 유지를 위한 도내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하수도 확충 등 연간 수천억 원의 수질개선 관련 예산을 떠안고 있다. 지역은 넓고 재원은 부족해 가뜩이나 재정운용에 압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소양강이 올해 또다시 흙탕물에 휩싸였었다. 여러 기관이 10여 년 전부터 흙탕물 저감사업에 나섰던 데 비춰보면 답답한 노릇이다. 근본적인 방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색하다. 사정이 이러해 보다 강화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를 꺼내든 것이 얼핏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는 수계 일대 지역발전을 더 옥죄는 악영향을 내포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그렇지만 유예됐던 수질오염 총량제가 이르면 2016년부터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지역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흙탕물 유입 방지, 하수처리 시설을 충실히 갖추는 게 과제다.
올해 들어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내는 물이용부담금 납입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기금이 600억 원이나 남았는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유역 토지 매입비에 반영하는가 하면 오염총량제 기금충당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더욱이 상수원 수질개선 비용도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러자 한강수계관리위는 토지매수사업 예산의 상한선을 연도별 기금예산의 20% 이내로 정했다. 문제는 상류지역 하수처리 시설 확충이다. 한강수계기금과 정부 지원액은 전체 투자액의 55%에 불과할 뿐이다. 그만큼 도와 시·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물 이용자들이 수질개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청정지역 총량제의 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 비용 연구' 최종보고회의 요지도 마찬가지다. 한강 수질오염 총량제에 대비한 시설 구축을 도와 유역 시·군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 상류 오염방지 시설이 미진하면 하류의 수질개선 부담은 몇 곱절 가중된다. 한강수계기금의 지혜로운 운용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