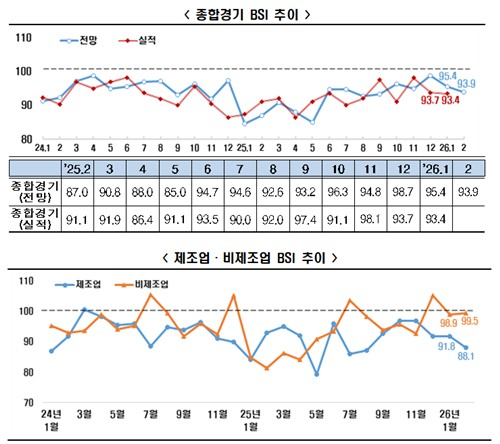조선 제5대 임금 문종의 국상을 치르느라 많이 허약해진 단종에게 신하들이 술을 권해 기운을 되찾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독주가 된다. 잘못하면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조선 태종17년(1417년) 윤5월4일 금천 현감 김문(金汶)은 안양사(安養寺)에서 베풀어진 과천 현감 윤돈(尹惇)의 전별연(餞別宴)에 참석했다가 과음한 나머지 목숨을 잃었다. 이 일로 수원 부사 박강생과 봉례랑 윤돈은 파직을 당했다(황성규, 새내기와 술, 2008).
▼유교 사회 조선에 술은 통과의례가 많았다. 허참례(許參禮)는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는 관원이 선배 관원에게 술과 안주로 성의를 베풀던 의식이었다. 이 '신고식'으로부터 열흘 뒤쯤에 면신례(免新禮)가 이어졌는데 이 의례를 치러야 비로소 선배 관리와 동석(同席)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들 술자리는 신참 괴롭히기 악습이 심해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는 극에 달했던 모양이다. 보다 못한 율곡 이이가 나서 이 폐습을 없애도록 건의했지만 근절되지는 않았다.
▼오늘날 대학가의 축제와 신입생 환영-신고식에서 허참례·면신례의 흔적을 발견한다. 새내기에 대한 '기강잡기' 내지는 '길들이기'로 변질되곤 하는 이들 행사는 이따금 꿈 많은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5, 6월 도내 대학가에는 각종 축제로 젊음이 넘쳐난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교 축제장 주류 판매 금지령'에도 불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류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 축제장에서는 버젓이 학생들에 의해 술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교육부의 협조 요청이 유명무실하다.
▼청춘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는 술. 이제는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지침을 내려보내기 전에 대학 사회의 청춘들이 알아서 자정해야 한다. 대학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 책임이 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는 '젊은 피'를 사회에 끊임없이 수혈해야 한다. 대학가의 축제가 술판으로 변질되면 그 축제는 청춘의 특권이 아니라 타락과 후회의 길이다.
권혁순논설실장·hsgw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