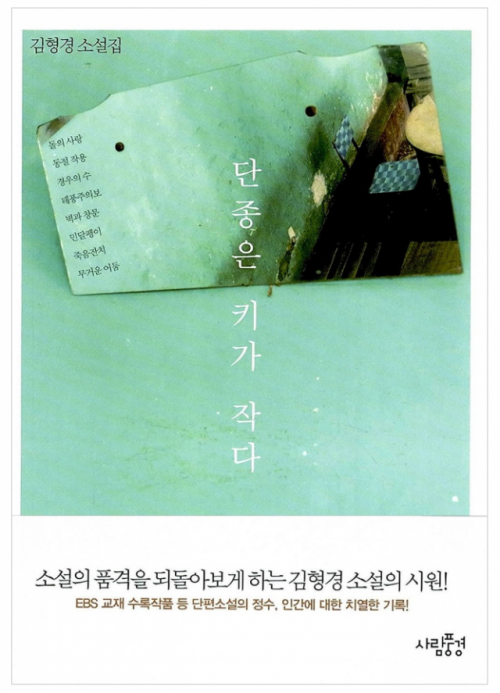
이번 주에 소개할 강릉 출신 김형경의 단편소설 ‘단종은 키가 작다’는 문학적으로 영월에 대해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테마 중 하나인 ‘단종’을 소재로 삼고 있다. 춘원 이광수(1892~1950년)가 1928년 11월부터 1년여간 동아일보에 게재한 ‘단종애사(端宗哀史)’도 단종을 이야기의 중심에 세우고 있지만 역사소설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과는 분명 다른 결을 갖고 있다.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의 장편소설 ‘영영이별 영이별’도 단종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고 있지만 역시 단종의 부인인 정순왕후 송씨의 시선을 빌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월에서 벌어지는 일을 중심에 둔 ‘단종은 키가 작다’가 이 코너의 취지에 더 찰떡같이 어울리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소설은 1991년에 발표된 김형경의 첫 소설집의 표제작으로, 수록된 다른 작품들과 함께 EBS 교재에 예문으로 실릴 정도로 단편소설의 전범(典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 젊은 나이의 김형경이 쓴 이 짧은 소설들을 통해 후에 발표된 ‘외출’이나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운다’ 등 장편소설의 서사구조를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소설은 영월에 유배를 온 비운의 인물 단종(端宗·1441~1457년)을 기리는 행사인 영월 단종제를 취재하러 온 내가 단종제를 보면서 떠올리는 상념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소설 속 화자(話者)는 지방에 흩어져 전래되는 우리의 민속놀이를 지역별·유형별·시대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행사를 직접 둘러보기로 마음 먹고 온 첫 지역이 바로 영월이었다. 한밤 영월역에서 내린 나에게 다가온 영월의 인상은 “과연 유배지다운 곳”이었다. 시야를 막아선 검은 산들이 그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영월, 단종제의 이야기는 과거 겨레문화연구소라는 곳에 함께 있었던, 민속놀이는 민속놀이대로 내버려 두라는 식의 냉소적인 말을 내뱉던 성일과의 일화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어진다. 소설은 현재 단종제에 있는 나와 과거 성일의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이중구조로 진행된다. 주인공은 단종의 죽음을 기리는 단종제가 현대사회로 오면서 화해와 화합의 흥겨운 축제로 변모된 사실에 대해 못마땅해 하면서 민속행사는 집단 최면이라고 한 성일의 말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문화가 품은 정치성, 자기위안의 코드를 읽어 내기도 한다. 또 단종을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는 영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역사를 추동한 민중의 힘을 보기도 한다.
소설을 읽다 보면 소설의 제목에 대한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주인공이 신라나 백제의 잘 다듬어진 왕릉, 천마총이나 무열왕릉 같을 것이라고 장릉의 규모를 짐작했다가 의외로 초라한 규모를 보고는 “단종은 키가 작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이야기 뒤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이야기를 가져 온 점도 눈길을 끈다. 소설 속에는 청령포와 동강 낙화암, 소나기재 등의 지역명이 곳곳에 등장하며 사실감을 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