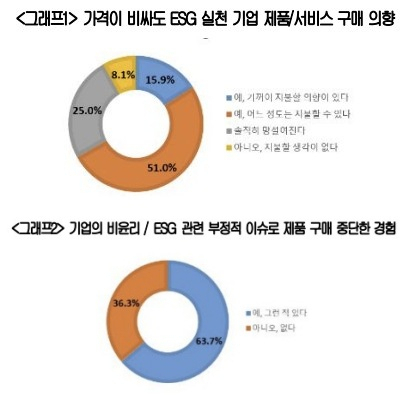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로 시작하는 ‘반달’이라는 동요가 있다. ‘산토끼’와 함께 토끼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노래다. 토끼는 늘 귀엽고 영민한 짐승으로 인식되어 왔다. 오죽하면 ‘토끼 같은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겠는가. 그만큼 토끼는 우리 민족의 문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토끼 설화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인도 지역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유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토끼의 이미지가 널리 사용되었다. 고구려 고분벽화라든지 신라의 숫막새기와에 토끼가 등장하며, 사찰 벽화나 창덕궁, 경복궁과 같은 궁궐에서도 토끼가 발견된다. 그만큼 한반도 지역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토끼를 친근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윤극영의 동요 ‘반달’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달 속에 토끼가 산다고 여겼다. 왜 달 속에 토끼가 사는지에 대한 설화는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지만, 그 사정은 이렇다. 중국 하(夏)나라 때 최고의 명궁이었던 예(?)가 서왕모(西王母)에게 불사약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 항아(姮娥)는 불사약을 몰래 훔쳐 먹고 달나라로 도망을 쳤다고 한다. 그런데 당나라의 명문장가 한유(韓愈)가 쓴 ‘모영전(毛穎傳)’에서는 토끼가 항아를 훔쳐서 두꺼비를 타고 달나라로 갔다고 했다. 당나라 이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이런 설화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에서 달을 상징하는 존재로 월궁항아, 두꺼비, 토끼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달을 토섬(兎蟾)이라고도 한다.

‘구토지설(龜兎之說)’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걸 보면 토끼가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은 연원이 매우 오래되었을 것이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병사를 요청하러 갔다가 도리어 감옥에 갇혔을 때 들은 것으로, 거북이에게 속아서 용궁으로 간 토끼는 자신의 간을 두고 왔다며 용왕을 다시 속여서 무사히 육지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이야기다. 훗날 판소리 ‘수궁가’의 근원 설화가 되었다고 전한다.
우리나라 설화에는 토끼가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유형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한겨울 배가 고픈 호랑이가 먹을 것을 찾아 어슬렁거리다가 토끼를 만난다. 위기에 봉착한 토끼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 준다면서 호랑이를 강으로 데려간다. 호랑이 꼬리를 물에 담그고 한참 있게 하였는데, 추운 겨울이라 그만 얼어붙은 것이다. 그 사이에 토끼는 도망을 쳤다고 한다. 지역마다 약간의 변형은 있지만 이러한 구조로 구성된 설화는 대체로 토끼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지혜담이라 할 수 있다. 힘이 약한 토끼에게 지혜와 꾀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으리라. 앞서 말한 구토지설이나 수궁가에서 토끼는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목숨을 바쳐야만 하는 존재였고, 호랑이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존재였다. 그것은 권력자들의 횡포와 억압 속에서도 그 험난한 상황을 멋지게 따돌리고 살아남았던 민중들의 지혜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수궁가를 들으며 용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토끼에게 열광했던 조선의 민중들도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그 외에도 토끼는 그 왕성한 번식력이라든지 달을 쳐다보기만 해도 새끼를 낳는다는 속설 때문에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또한 음력 정월 첫 번째 ‘묘(卯)’가 들어 있는 날을 상묘일(上卯日)이라고 한다. 이날 새로 뽑은 실을 톳실(兎絲)이라고 하는데, 이 실을 지니고 있으면 장수한다는 풍속이 있다.
계묘년을 맞아 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희망을 바라보는 눈길은 같을 것이다. 아무리 권력과 자본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도, 유쾌하게 그 흐름을 비껴가면서 자신의 운명과 삶을 개척해 나가는 토끼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기록했지만, 그것을 바꾸어 가는 것은 지혜로운 백성들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