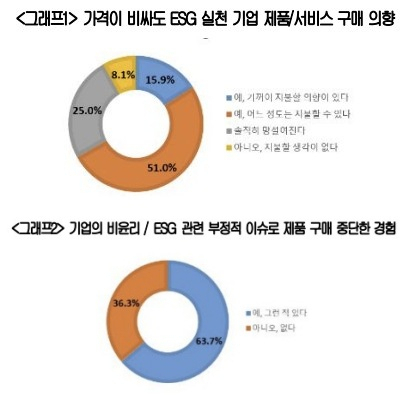최근 우리나라 양봉산업이 기후 변화와 병충해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몇 해에 걸쳐 꿀벌이 집단 소멸 또는 폐사로 인하여 양봉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함으로 절실하게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이상 기후와, 농약의 항공 살포, 응애류의 내성과 외부기생충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자체 별로 피해 농가에 입식과 기자재, 방역약품 등을 지급 지원하고 꿀샘 식물 사업으로 녹색환경 조성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종교 단체도 참여해 헛개나무를 기증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에 꿀샘 식물을 식재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농협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빠르게 대처해 2019년부터 육지에서 4㎞ 이상 떨어진 섬에서 저항성토종벌(한라벌)을 육종 번식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토봉 농가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전남 해남 완도에 노화도라는 섬에서 대량 번식을 하여 분양을 받아오고 있다.
국내 양봉 산물 시장 금액이 5,000억이라면 화수분 매개를 통한 생태적 공익 기능은 70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수려한 산림자원은 국민 모두가 즐겨 찾고 즐기는 휴식 공간과 농가 소득원으로 이어지며 생태계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생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벌꿀 생산은 70% 이상이 아카시아꿀이며 아카시아나무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지역에 따라 유채, 밤, 피나무, 때죽나무꿀이 생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소량이다.
아카시아나무를 외래종으로 북미가 원산지로써 19세기 후반부터 도입 되었다고 하는데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는 속성수이며 민둥산의 산림 녹화와 사방용으로 큰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왕성한 번식력으로 산림은 물론 하천과 공사장 주변에 심어 국내에서는 최고의 밀원이었으나 농경지와 묘지 및 정원 주변으로 퍼져 산주와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환영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제거하여 왔으며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아카시아나무의 병충해와 나무의 노령, 이상 기온 등으로 인해 꿀 생산 작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로 반복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90%를 자치하는 100대 주요 작물중 70여개의 작물이 꿀벌이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Food Agriuclture Organiztion) 분석으로는 벌꿀의 멸종은 식량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와도 직결 된다고 하는 증차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꿀벌의 폐사와 실종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짐으로 양봉 산업은 물론이며 화분 매개 농업이 함께 붕괴되는 위협을 받고 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지구 환경 특히 생태계의 악화가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생태계 유지에 30%이상을 기여하고 있는 꿀벌들이 소멸되고 있어 인류에 재앙을 가져올 정도로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가 진행 된다는데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꿀벌에 의해서만 수분을 하는 식물은 멸종 위기에 직면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생태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10여년 전부터 토종벌의 봉충낭아라는 질병에 의해 멸종 위기 직전까지 경험을 하였다. 현재는 원인 모를 질병과 소멸로 인해 크게는 생태계는 물론이고 작게는 양봉 산업의 몰락과 나아가서는 양봉 농가의 경제적 위기까지 겹쳐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귀농과 귀촌 그리고 은퇴자 등 너나없이 뛰어들고 있는 현실에 사육환경은 더욱더 약화되고 있어 안타깝다.
꿀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 식물을 제공하고 산주에게는 꿀샘 식물숲 조성을 통해 임대소득을 올리게 하고 상업 양봉인에게는 소비자가 원하는 천연꿀을 생산할 꿀벌 목장을 제공, 화분 매개 뿐만 아니라 농약을 치지 않는 친환경 숲과 설탕물로 만들지 않는 천연꿀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양봉산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