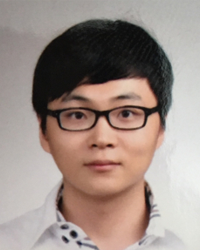
판에 박은 듯 쓰이는 문구나 표현을 지칭하는 용어인 ‘클리셰(Cliche)’는 인쇄와 관련이 깊다. 원래는 활자를 조판해 인쇄하는 활판인쇄에서 자주 쓰는 글자를 묶어 한 개의 활자처럼 묶어 놓은 것을 뜻했다.
필연적으로 활판인쇄를 했었던 우리나라 신문에도 클리셰가 있었는데 대통령(大統領) 대신 다른 단어(犬統領이나 太統領 같은)가 들어가는 인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大·統·領 3개 활자를 클리셰로 묶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폭우는 ‘마른장마’가 이어졌던 평년이나 강풍주의보·호우특보·폭염특보가 동시에 발령되며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혔던 지난해 6월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마치 회차를 더해 갈수록, 시리즈를 더해 갈수록 강해지고 변화하는 악당이라는 클리셰처럼 재난의 모습은 그리고 그 피해 양상은 국민의 예상을 뛰어넘는 형태로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 기상청이 2022년 발간한 ‘장마백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강수강도는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가 1980~1990년보다 최근 20년 새 20% 이상 증가했다.
이번 비도 이른바 ‘유례 없는’ 폭우로 전국에 수백㎜가 넘는 비를 뿌리고 수십명의 사망자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도내에서도 원주와 정선에서 각각 1명씩 총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옹벽 붕괴, 농작물 115㏊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철길도 막혀 태백선과 영동선, 중앙선, 관광열차 등 4개 선의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변화하는 재난의 모습과 달리 여전히 우리가 기시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일부 지식인 등의 경고와 이를 무시하다 결국 재해·재난이 터지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책임자,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돕는 구조대와 일반인 영웅들 등등.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재해·재난 사고의 클리셰다.
그래도 이번 재해에는 클리셰를 ‘파괴’한 모습들이 눈에 띄기도 했다. 지난 9일 300톤, 13일 1만톤이 넘는 규모의 암석이 무너져 내렸던 정선 군도 3호선 세대 피암터널 산사태에는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6~7일 1~3톤 가량의 산발적인 낙석이 발생하자 정선군은 낙석 발생지점의 드론 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추가 붕괴를 우려하며 양방향 전면 통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원주천이 범람하자 인근에 주차된 차량 30여대의 차주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이동 조치를 안내한 원주경찰서 봉산지구대의 사례나 주택의 담이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옹벽 철거를 요청한 평창지구대의 사례 등도 그러하다.
물론 물밑에서 상습침수지역, 재해지구 정비에 꾸준히 재정을 투입해 피해를 사전에 대비한 지자체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주말 예고된 비가 내리기 전의 그 짧은 기간 도내 지자체와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군부대 등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긴급 복구에 들어갔다. 조만간 찾아올 태풍도 대비해야 한다. 철저한 대비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진부한 클리셰만은 지켜지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