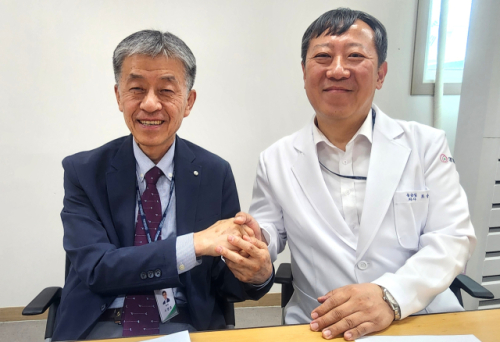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제는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응급업무나 아동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몇 시간씩 방황하거나 대기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흔히 대형 병원은 불친절하고 권위주의적이라는 환자들의 불만이 부단히 이어지고 있다.
대형 병원에는 환자가 늘 많이 몰려 혼잡하기 때문에 진료에 제약이 많다. 의사는 점심시간마저 부족할 정도로 진료에 매진하지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은 늘 확보하기 어렵다. 비대면과 다름없는 모니터 진료와 간단한 설명으로 신속히 다음 환자로 넘어가는 기계적인 태도로 인해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환자나 보호자들은 혹시 불이익이라도 있을까 불안해서 또는 업무 과다에 지친 의료진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필자도 안과 정기 검진을 장기간 다니면서 녹내장, 망막박리, 황반변성 등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라 의사에게 문의했으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특정 안압약을 장기간 투여하면 속눈썹의 이상발육으로 눈을 찌르는 경우가 있고 약물로 인해 눈 주변이 가려운 부작용이 생긴다는 사실도 나중에 고통을 겪은 후에야 알게 됐다.
자꾸 캐물으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의학 교육 장면이 아니라는 핀잔을 들어 무안해진 적도 있다. 비록 일부 의사의 잘못된 행동일지라도 이들로 인해 대다수 의사의 친절한 행동이 무색해진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대학병원을 겸하는 대형 병원에서 환자에게 인턴이나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으로 환자를 검진하거나 참관하는 것에 대해 사전 양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환자에 따라서는 진료실에 이들이 참관하려고 늘어서 있으면 놀라서 당황하거나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며 무시당한 느낌마저 들 수 있다.
비록 수련 과정이라고 해도 담당 의사가 아닌 수련의들의 시선에 환부를 전시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은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래전에 대형 병원에 2주일 입원도 하고 지금도 다른 질환으로 검진을 가끔 받고 있지만 한 번도 수련 과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에 조금이라도 설명조차 들은 적이 없다.
대학병원에 오면 전공의 수련을 위한 검진도 받게 된다는 것을 환자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실을 해당 환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환자의 인권존중을 위한 병원의 당연한 책임이다.
환자가 원치 않으면 실습 대상이 되는 것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수련 과정에서 환자에게는 불필요할 수도 있는 여러 번의 검사도 수반될 수 있고 다수가 참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줘야 해당 환자의 의혹이나 불안을 해소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의료진이 다양한 환자들을 상대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절박한 환자들의 처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