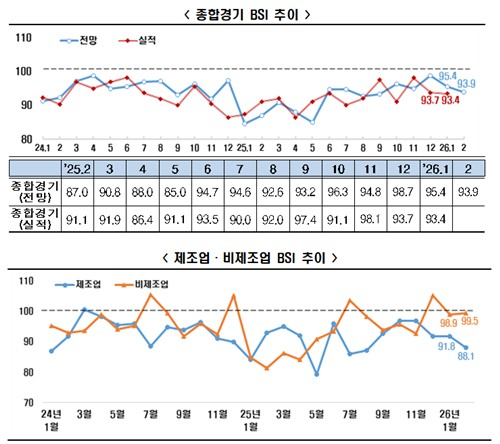몸살 난 집을 데리고 경주로 가자
빈 노트가 스케치하기 전 살며시 문을 열어
비에 젖어도 바람에 옷이 날려도 좋아, 아무렴 어때
나갈 때 잊지 말고 우산을 챙겨줘
돌아온다는 생각은 깊은 장롱 속에 넣어두고
먹다 만 밥은 냉동실에 혼자 두고
머리는 세탁기에, TV는 버리고 발가락이 듣고 싶은 곳으로
실선으로 그려진 옷소매에 손을 넣고 버스에 올라
별이 기웃거리기 전에 도착해야 해
능소화 꽃잎 같은 사연을
페달에 담아 바람에 날리자
친구가 필요할 거야 그럴 때는 친구를 잊어
무덤 속 주인이 말했다
지퍼처럼 잎을 내렸다 올리고
꽃은 단추처럼 피었다 떨궈줘
발자국이 세든 골목에 비릿한 바닥을 핥을 때
날실 머리는 잡고 씨실의 허리를 감으며 하나, 둘 잘라줘
촉촉한 파스타에 울던 사람, 발을 만져봐 배가 고플 거야
바늘로 빵을 찌르는 제빵사의 손길
먹줄 실 뽑아 바닥을 튕기는 거미의 솜씨
어긋난 선을 바늘이 엮어주면
옷이 한눈에 주인을 찾아, 보란 듯이 걸쳐 줄래, 그거면 충분할 거야
버스는 늘 먼저 떠나
박물관 뒷길은 혼자된 연인만 걸어가지
거기 길이 끝난 곳에 당도하면
길과 길을 잇는 재봉틀이 떠오를 거야
한 벌의 옷을 짓고 거기에다 누군가 몸을 넣는다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머리끝에 꽃이 달리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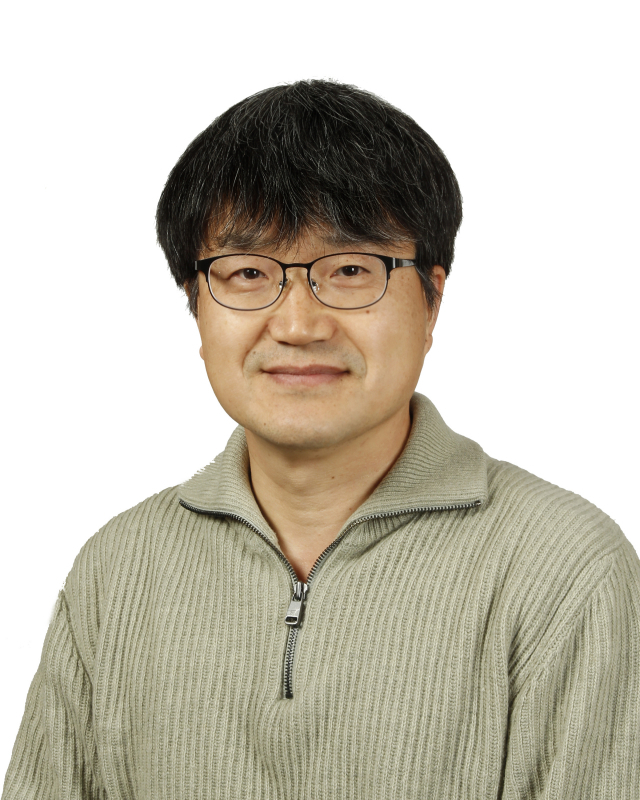
사람이 중요했다. 머리에서 나오는 날것들을 적었다. 시라기보다는 시래기를 엮듯 줄에 묶어 매달아 놓았다. 계속 매달려 있어야 했다. 먹지 못하는 벽을 채웠다. 바람벽 뚫린 구멍으로 엿보기만 했을 뿐이었다. 시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과 일주일에 한 편의 시를 적었다. 이 한 편을 위해 시집을 한 권씩 밥 먹듯이 읽었다. 비 오는 날 멸치를 종이 위에 놓고 몇 시간을 보았고 영양 자작나무 숲을 찾아가다 돌배나무에 기대 쓰러지는 집도 보았다. 동짓달에 구수한 시래기죽 한 그릇을 대접할 기회를 주신 강원일보와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절을 올리고 싶다. 딱 이렇게만 살고 싶다. 일어나 상큼한 과일 먹듯 세 편을 읽고, 아침 먹고 소화제로 한 편, 점심 때 커피 마시듯 세 편, 졸릴 때 얼음 뜬 감주 같은 한 편, 저녁에 퇴근하며 지나가듯 한 편, 설거지 마치고 정리하듯 두 편, 잠들기 전 돌아보고 한 편! 그리고 꿈속에서 딱 한 편의 시를 쓰고 싶다. 아직은 미흡하고 거칠고 아둔한 상태로 출발점에 서 있다. 더 단단해지기 위해 숨을 가다듬는 중이다. 시를 쓰는 길로 이끌어주신 안도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고민하며 고칠 수 있도록 옆에서 때려주고 위로해준 글 친구 전정화 선생님, 김경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실 가장 좋아하는 시는 가족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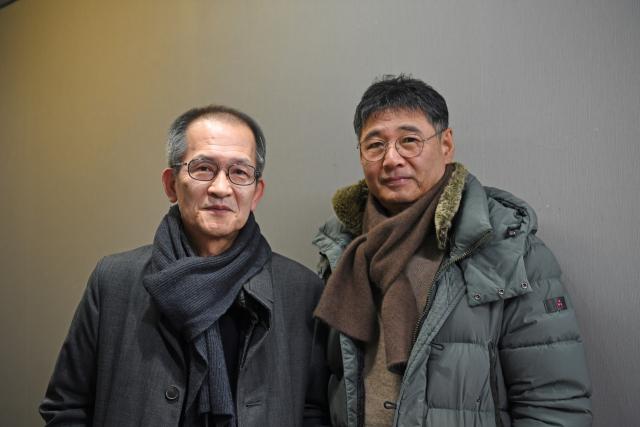
올해도 응모작이 많았고, 수준 높은 작품 또한 즐비해서 심사위원들은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최종까지 남은 작품은 조민주의 ‘풍경이 기둥을 세워요’, 허창호의 ‘겨울 미나리’, 황영기의 ‘길을 짜다’ 등이었다.
조민주의 ‘풍경이 기둥을 세워요’는 최종심에 오른 작품들 가운데 젊은 감각이 가장 돋보였다. 전철을 타고 가면서 보고 느끼는 풍경의 변화와 배우가 되고 싶은 이모의 삶을 교차해 나가며 삶의 비의를 찾아내는 솜씨가 빛났다. 특히 화가처럼 발달된 색채감각을 통해 시를 감각적이면서 다채롭게 직조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났다.
허창호의 ‘겨울 미나리’는 겨울 미나리의 생태를 비유의 뼈대로 삼아 삶의 고단함을 그려낸 작품으로, “시퍼런 울음을 자주 삼키면 부드러운 줄기가 됩니까?”라는 구절처럼 비유의 자연스러움,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돋보였다. 함께 보내온 작품들 역시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 유연하고 구성이 단단하여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
당선작으로 선정한 황영기의 ‘길을 짜다’는 제목 그대로 길을 짜가는 ‘열린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읽는 이에게 감상의 즐거움과 동시에 자유로움을 선사하는 매력이 있었다. 함께 보내온 ‘묵호항’ 등의 작품도 리얼한 삶의 현장에서 끌어올린 숙성된 표현들이 빛을 발하고 있어 오랜 습작을 거친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홍섭·장석남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