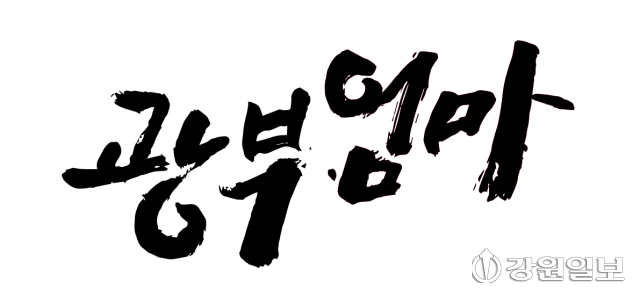광부를 흔히 산업역군이라 부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바스라졌다.
석탄산업합리화 직전인 1988년 44만명에 달했던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탄광도시의 인구는 2024년 6월 현재 17만명까지 줄었다.
막장의 어둠, 분진, 굉음과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탄광을 떠났다. 그리고 오는 7월1일 마지막 남은 태백 장성광업소,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까지 문을 닫으면 남은 사람들마저 떠날 것이다.
언뜻 암울해 보이지만 찬란했고 굉음의 증기처럼 역동적이었던 석탄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
검은 탄가루와 땀으로 범벅이 된 광부, 헌신적인 아내, 강인한 엄마…폐광을 앞두고 강원일보가 지난 두달여 간 심층 취재·보도했던 여성광부 ‘선탄부’들은 탄광촌의 그 누구보다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었다.
광산에서 가장을 잃은 이들이 지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열악한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우정이었다.
저물어 가는 석탄의 시대, 이제 얼마 남지않은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탄광에서 만난 평생 동기=“쿨럭 쿨럭 ” 퇴직 선탄부 황순옥(80‧삼척시 도계읍)씨의 하루는 어김없이 거친 기침 소리로 시작된다.
7월 진폐 정밀 검진을 앞두고 올해도 장해등급을 받지 못할까 황씨는 걱정부터 앞선다. 시종일관 심각한 표정의 황 씨를 웃음 짓게 만드는 건 이웃에 사는 선탄부 동기 김옥랑(83‧삼척 도계읍)씨였다. 40년 전 삼척 도계광업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선탄부 동기로 15년간 함께 일하는 동안 황 씨와 김 씨는 동료이자 친구, 가족같은 존재가 됐다.
황순옥씨는 1980년 선탄부가 됐다. 궁핍한 생계를 위해 들어선 일터에게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동료들의 텃세였다. 굼뜬 손의 신입을 반겨주기엔 팍팍했던 선탄장의 삶. 계속되는 텃세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황 씨는 1983년 도계광업소로 일터를 옮겼고, 그곳에서 김옥랑 씨를 만났다.
황순옥 씨는 “처음 취직한 선탄장에서 장화 닦기, 도시락통 씻기 등 허드렛일이 다 내 몫이 었는데 몸이 힘든 것보다 서러운 마음을 참는게 더 힘들었다”며 “도계 광업소에 처음 간 날 당시 최고참이던 김옥랑 언니가 ‘잘해보자’며 반겨주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고 말하며 김 씨의 손을 잡았다.

■동료이자 이웃, 자매였던 동기들=귀를 먹먹하게 하는 굉음도, 눈 앞을 가리는 분진도 동료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당시 도계광업소에서 일하던 30여 명의 선탄부들은 2인 1조로 짝을 지어 작업을 이어갔다.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생계에 무게에 짓눌린 여성들은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하루를 버텨냈다.
‘일하는 엄마’가 흔치 않던 시대. 선탄부들은 세상의 선입견에 끊임없이 부딪혀야 했다. 하지만 선탄장에서 만큼은 그녀들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몸이 아프면 동료들이 대타를 자청했고, 3교대 야간근무로 집을 비운 동료를 대신해 아이들의 잠자리를 돌봐줬다.
김옥랑 씨는 “다 먹고 살려고 모인 짠한 사람들인데 편을 가르고 텃세를 부리면 뭐하나 싶어 동료들끼리 더 끈끈하게 지냈다”며 “기계가 멈춘 사이 아이들 크는 이야기를 나누고, 탄가루가 가라앉은 도시락을 먹으며 다가오는 월급날을 손꼽는 게 하루의 낙이었다”고 말했다.
황순옥 씨는 “자식들이 학교에 가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던 매 순간 선탄부 동기들이 곁에 있었다”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준 이웃이자 자매였던 동기들 덕에 험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감한 여성들,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다=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황순옥 씨와 김옥랑 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모두 정년(60세)을 넘어 퇴직했다. 야속한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고 몸 곳곳에 병을 남겼다. 김옥랑 씨는 진폐증으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기침이 나며, 황순옥 씨는 난청까지 얻게 됐다.
하지만 그녀들은 절망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선탄장에 뛰어든 용감한 여성들. 그녀들은 이제 선탄부 동료들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료들과 지역 진폐협회를 찾아 머리를 맞대고 근로복지공단의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글을 모르는 동료를 위해서는 기꺼이 서로의 눈이 됐다.
황순옥 씨는 “숨이 안 쉬어지고 귀가 먹먹한 증상이 십여 년 전부터 심해졌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넘어갔다”며 “동료 선탄부들이 산업재해라고 알려준 덕에 난청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다음달에는 진폐 정밀 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폐장해등급 13급으로 누구보다 진폐의 고통을 잘 아는 김옥랑 씨. 그는 더 많은 동료들이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 김 씨는 “똑같이 탄가루를 마시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 장해를 인정받고 지원을 받는 선탄부들은 절반도 안 된다”며 동료들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험한 시절, 서로가 있어 버틸 수 있어”=여전히 40년 전 서로의 앳된 얼굴이 눈에 선하다는 황순옥 씨와 김옥랑 씨. 당시 동료들의 이름을 되뇌던 두 사람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가족보다 가까웠던 이들은 새 보금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소식조차 접하기 어려워졌다. 그 사이 세상을 떠난 이들도 많다. 동료들의 수를 헤아려보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다.
황순옥 씨는 “몸이 부서져라 일해도 늘 배고프던 시절, 그저 팔자겠거니 버텼던 선탄부들이 이제는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며 거친 손을 맞잡았다. 김옥랑 씨 역시 “순옥이가 우리는 세월을 잘못 타고나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으니 됐어”라며 웃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