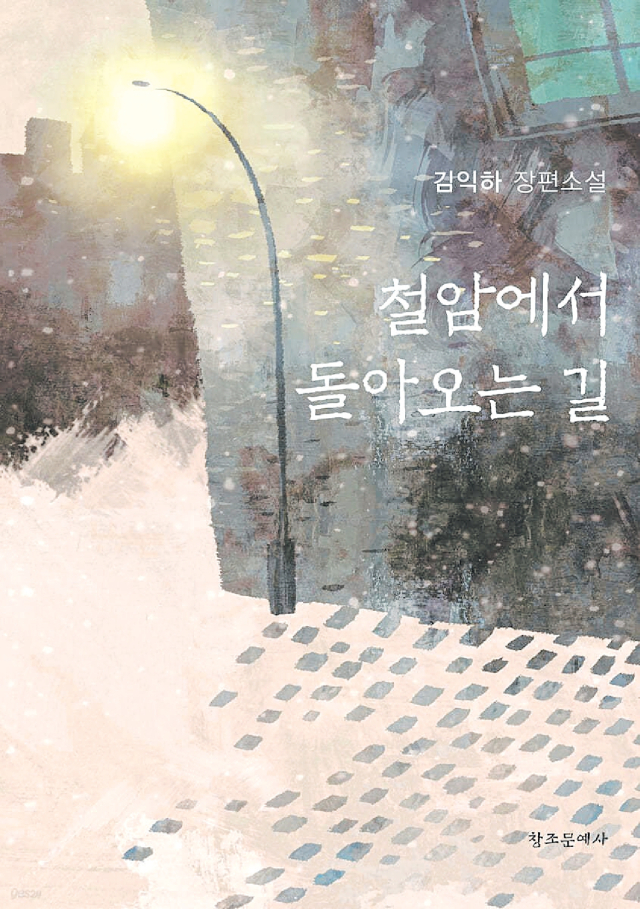
삼척 출신 김익하의 ‘철암에서 돌아오는 길’은 현재 시점의 이야기 속에 과거 회상이 액자처럼 삽입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같은 구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등장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폐광의 시대, 막장에 내몰려진 사람들의 치열한 삶을 반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 없이 집어 든 소설이다. 다만 실제 광부들이 쓰는 생소한 용어가 많다 보니 각주를 과도하게 쓴 점은 다소 눈에 거슬린다.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다. 소설의 주인공 정길남은 아버지의 유골을 이장하기 위해 아들 이교와 함께 철암을 찾는다. 철암은 탄광 산업의 쇠퇴로 잊힌 땅이 돼 있었지만, 정길남에게는 젊은 시절의 삶과 죽음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는 아버지의 묘 이장을 준비하며 탄광촌의 옛 모습과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린다. 정길남은 철암에서 탄광 사고와 진폐증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묘를 찾아 그들의 삶과 죽음을 회상한다. 그는 황지로 이동하며 탄광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과거를 회상한다. 젊은 시절 탄광에서의 삶과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꿈과 좌절을 떠올리며 아들 세대와의 차이를 느낀다.
정길남은 서울에서 온 청년 함석주를 만나 그의 사정을 듣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다. 함석주는 과거 운동권 학생으로서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안고 철암으로 숨어든 인물이었다. 정길남은 함석주가 탄광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지만, 함석주는 서울에서의 삶과 철암에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며 방황한다. 정길남은 함석주의 유품인 노트를 통해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가 겪었을 고통과 혼란을 이해한다. 함석주는 탄광 사고와 동료들의 죽음을 겪으며 삶과 죽음,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대해 고민한다.
한편, 신소정은 함석주를 찾아 철암으로 향하고, 정길남의 집에서 그를 기다린다. 함석주는 탄광 사고로 목숨을 잃고, 신소정은 그의 죽음 앞에서 오열한다. 정길남은 함석주의 죽음을 통해 탄광촌의 냉혹한 현실과 젊은이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다.
소설은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철암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탄광 산업의 흥망성쇠와 함께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픔과 슬픔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소설 속에서 철암은 고된 노동과 그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곳으로 나온다. 하지만 삶을 이어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장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철암은 늘 죽음의 위협과 삶이 공존하고 희망과 절망, 꿈과 좌절이 친구처럼 동행하는 이율배반의 공간이다.
소설은 탄광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과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석탄 산업의 발전과 쇠퇴라는 흐름 속에서 광부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의 꿈과 좌절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폐광이라는 현재의 상황과 어우러져 눈길을 끄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석기기자 sgto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