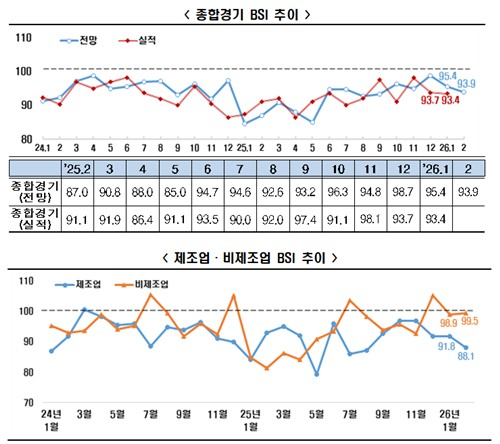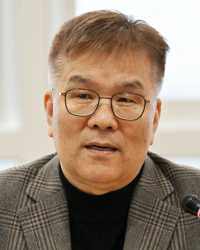
뱀은 고대부터 세계 각 지역의 문화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서 독특한 문화 상징을 형성하였다. 성경이나 불경을 비롯한 종교서나 신화 등에도 뱀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뱀의 상징은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뱀을 생각할 때 유혹과 악마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성경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징그러우면서도 음흉한 느낌을 받는 것은 그것이 가지는 신체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음습한 그늘에서 살아가는 생태적 특성과 눈꺼풀이 없는 신체적 특성은 뱀이 우리에게 주는 긴장감을 만드는 요소로 작동한다.
뱀이 늘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춘천 청평사에 전하는 상사뱀 설화라든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전승되는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뱀은 사랑의 이미지를 가진다. 그러나 고대 사회부터 형성되어 온 뱀의 이미지는 지혜로움과 관련이 있다. 부드럽게 휘어지면서도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자연스럽게 지나다니는 모습에서 어떤 장애물도 지혜롭게 헤쳐 나간다는 점을 읽어낸 것이다. 판단력이 빠르고 주변을 늘 살피면서 조심하는 모습에서도 뱀의 지혜를 읽어내기도 했다. 수메르의 신화에서도 지혜의 신이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십이지지 중에서 뱀처럼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는 존재도 없다. 농경사회에서 뱀은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존재기도 하지만 농사에 해를 입히는 짐승을 잡아먹는 존재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설화에서도 뱀은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나타난다. 원주 치악산 전설에서도 꿩을 잡아먹는 뱀을 방해했다가 곤란에 빠지는 선비가 등장한다. 청평사의 상사뱀도 공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곤혹스러운 존재였겠는가.
다른 한편 뱀은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제주도를 비롯하여 남해안 도서지역에서는 뱀 토템이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제주도 칠성본풀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스님의 아이를 임신한 탓에 바다로 버려진 아가씨가 일곱 마리의 뱀을 낳고 그 자신 역시 뱀을 변하여 제주도로 떠내려 온 뒤 칠성부군으로 모셔진다는 내용이다. 조선 시대 기록에서도 제주도의 뱀 토템은 매우 특이한 풍속으로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집안을 배경으로 전승되는 가신신앙에서 업(業) 혹은 업신(業神) 역시 뱀의 신성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구박 받던 며느리가 매일 광에서 쌀을 가져오다가 만나는 구렁이에게 먹을 것을 준다. 훗날 분가를 하게 되자 시어머니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고 묻자, 자기가 없으면 굶주리게 될 구렁이가 불쌍해서 구렁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분가를 한 뒤 며느리의 집은 나날이 부자가 되었는데, 구렁이가 바로 업신이었던 것이다. 업신은 한 집안의 재산과 부(富)를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뱀은 재생, 불사신의 이미지를 가진다. 허물을 벗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에서 그런 이미지가 생겼을 것이다. 고구려 고분인 사신총에서 북쪽을 상징하는 현무(玄武)는 거북이를 뱀이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의 뱀은 불사신의 의미를 가진다.
그 외에도 뱀은 다산(多産)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새끼를 부화하기 때문이다.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위해 상처를 치료해주는 풀을 물어다 준 설화에서 잘 볼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역시 뱀으로 나타나고, 치유의 신인 헤르메스의 지팡이에도 뱀이 보인다. 지금도 의료 단체의 엠블럼에서 뱀을 그리는 것 역시 이와 관련된다. 어떤 사람들은 뱀에게서 진취성을 읽기도 한다. 뱀은 결코 뒷걸음질을 치지 않는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가졌다.
우리는 지난 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것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을사년 뱀의 해를 맞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발현하기를 기대한다.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뱀의 신성한 치유력이 발휘되어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기대한다.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