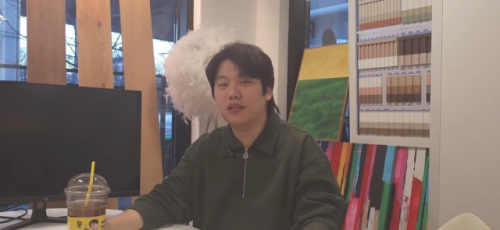도시의 비둘기 한 쌍이 빨간 한옥 지붕 용머리 끝에 앉아 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린다. 그 시각, 낯선 초로의 나그네가 서울 성북 S 병원 회랑 벤치에 앉아 통유리창 밖 이들의 동태를 응시한다. 그는 아침 일찍 북한강변길을 따라 달려와 지금 대형병원 3층 긴 회랑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 부부를 관찰하고 있다.
문득 젊은 날 그가 애송했던 성북동 노시인의 시가 떠오른다. 시인은 ‘성북동 비둘기’에서 자연 파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의 상황을 인간적인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노라’고 통탄한다.
오래전 시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성북동 비둘기는 오늘도 거리를 떠돌고 있다. 이 아침 초로의 나그네가 비둘기처럼 낯선 도시의 한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세월의 상념에 젖어들고 있다. 건너편 흰 벽 한구석에 걸린 대형 포토그래피-‘삶을 나누는 사람들’이 무수한 작은 별 아래 얼굴을 내밀고 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캐주얼 복장의 청춘들이 그를 건너다보고 있다. 순간,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밀물처럼 몰려든다.
아, 나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내 삶의 일부를 내어 준 적이 있었던가. 가물거리는 기억 속에서 칠십년이란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저 바다로 갔다. 광활한 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절망과 희망의 조각난 시간들. 때로는 풍선처럼 부푼 기쁨이었다가 때로는 거품처럼 빠지는 슬픔이었다. 이제는 기억의 퍼즐을 맞추는 일이 예전 같지가 않다.
그 많던 비둘기는 어디로 갔을까.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제 몸 태울 땔감 지고 길 떠나는 인도 노인처럼 ‘따가운 햇살 한 짐 지고 도시를 떠난’ 것인가.
도시의 하늘과 공원을 맴도는 비둘기들은 거리의 익숙한 풍경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가벼운 존재다. 하지만 아는가, 비둘기의 숭고한 역사를. 고대에는 인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서, 중세 유럽에서는 가정의 풍요를 나타낸 그들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고결한 상징이었다.
자연과 인간의 경계 사이에서 살아가는 비둘기들은 어쩌면 오래전 잊힌 우리의 이웃들이었는지 모른다.
일흔을 바라보는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초로의 나그네는 낯선 도시의 회랑에 우두커니 앉아 일흔다섯 삶을 반추하고 있다.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도시를 떠도는 저 성북동 비둘기처럼 오늘도 희미한 기억의 안개 속을 유랑하고 있는 고독한 이방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