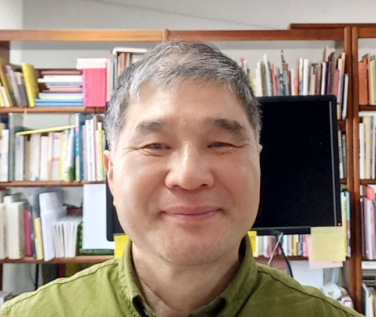“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생계형’이라는 수식어는 어쩌면 죄의 경중보다는 절박함의 무게를 증명한다. 단순한 규율 위반이 아닌 생존의 몸부림으로 읽힐 때, 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의 실패로 다가온다. 법이 허용한 마지막 자비의 틈, 춘천지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가 그 틈을 붙잡았다. 춘천지검과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는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 올해 상반기 총 50여명의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취업 지원 등을 유도했다. ▼“사기와 위증은 칼보다 날카롭다.” 명심보감의 한 구절이다. 하지만 칼을 들게 만든 배고픔은 누구의 몫인가. 기소유예라는 이름의 사법적 유예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다. 교화 가능성을 보는 안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입이다. 특히 반복적인 생계형 범죄 뒤엔 대개 사회적 고립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을 다시 길 위에 세우는 건 판결문 한 줄이 아니라 손길 하나에서 비롯된다.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는 그 손길을 제도화한 점에서 처벌이라는 일방통행을 되돌릴 수 있는 드문 여백이다. ▼우리 형벌제도는 오랜 세월 ‘경종(警鐘)’ 역할에 집중해 왔다.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준엄한 원칙은 지켜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생계형 범죄자의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다. 일자리도, 집도, 가족도 없이 벌을 받는 자와 모든 기반을 갖춘 채 사면을 받는 자 사이의 정의는 동일한 무게일 수 없다. 기회를 줬더니 범죄가 줄었다. 무연고 노숙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절도범에게 심리상담을 건넨 이 실험은 결국, 범죄자도 다시 사람이 되는 길이 있음을 보여줬다. ▼생계형 범죄자라는 말은 결국 ‘사는 게 죄’였던 이들에게 붙는 이름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름을 지우는 것 역시 우리 몫이다. 한 번의 실수에 인생 전체를 걸게 하지 않겠다는 사회, 단 한 번의 기회라도 허락하겠다는 국가, 그것이 ‘따뜻한 법치’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