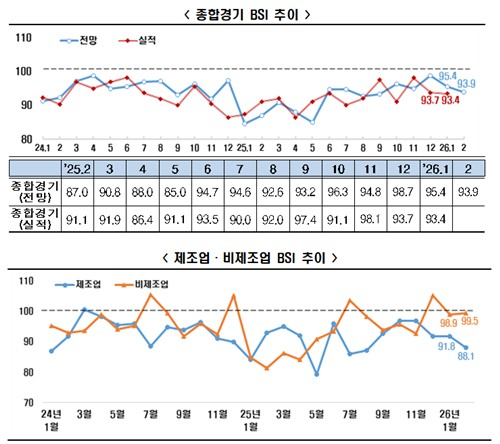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루핑집·돌구지사택·고삐사택·접사택=강원도의 옛 산촌 주택으로 너와집이나 굴피집을 꼽는데, 탄광촌의 옛 주택은 루핑집이다. 섬유지 위에 아스팔트를 입힌 루핑으로 덮은 집들이 언덕과 골목을 메웠다.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큼직한 돌을 얹은 지붕은 마치 농촌 초가집 위의 박덩이를 닮았다.
감시초소까지 있어 노동수용소에 가깝던 일제강점기의 광부 숙소는 해방 이후 미국의 대외원조 자금(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을 활용해 사택으로 바뀌었다. 1949년 태백시 장성지역에 사택마을이 조성되며 점차 삼척 도계와 영월 등지로 확산됐다. 사택은 보통 4~6가구 연립인데, 1950년대 동점동 돌구지마을 언덕에 들어선 강원탄광의 사택은 2가구 연립이었다. 영암선 철도 준공식에 참석했던 이승만 대통령까지 구경에 나서서, 스위스 별장 같다는 찬사를 보냈다.
산간계곡에 위치한 탄광촌은 주택지가 부족해 지형에 맞춰 사택이 건립됐다. 황지 어룡광업소 사택은 기차처럼 한 줄로 줄지어졌다 하여 고삐사택이라 불렀고, 두 동씩 붙여 지은 곳은 접사택이라 불렀다. 도계에는 6칸짜리의 육칸사택이 있었고, 정선에는 갱구 명칭을 딴 30항사택이 있었다. 주택은 남향을 선호한다지만, 초기의 탄광촌 사택은 3교대 광부의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향으로 지어진 곳이 많았다.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루핑집에서 살았다.

■탄광촌마다 있던 양반사택과 돌사택=탄광촌마다 ‘양반사택’이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간부가 거주하던 집을 양반사택이라 불렀는데 해방 후에도 광업소 관리자들이 사는 곳을 그렇게 불렀다. 태백시의 양반사택은 계산동 산비탈에, 삼척시의 양반사택은 도계 느티나무 주변에 정선군의 양반사택은 신동읍 종합운동장 위쪽에 있었다. 장성광업소 광부들은 ‘노보리 열 번 기는 것보다 양반사택 한 번 기는 것이 낫다’고 했다. 갱내 노보리(승갱도)를 힘들게 오르는 것보다, 관리자에게 인사 가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도계읍은 지금까지도 양반사택의 흔적을 보존하고 있다. 광산근로자복지센터 옆의 2칸 사택과 느티나무 옆의 4칸 사택 일대의 유신사택을 양반사택이라고 부른다. 이칸사택은 부장이, 사칸사택은 과장이, 육칸사택은 계장이 거주했었다.
1955년에는 국가에서 모범산업전사 19명을 선정하고, 돌사택을 선물했다. 목조사택뿐이던 시절에 제공된 돌사택은 광부를 산업전사로 각인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태백시 금천동에 모범산업전사 돌사택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하늘의 별 따기 사택 입주와 광부아파트=인력난에 시달리던 광업소는 사택 제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1,000명 이상 근무하는 대형탄광의 사택 보급률도 70%에 불과했으며, 1,000명 이하 탄광의 사택 주거비율은 39%, 500명 이하 탄광은 30%, 100명 이하는 19%로 더 떨어졌다. 1978년 장성광업소의 화광아파트를 시작으로 도계광업소의 희망아파트 등 탄광촌에도 아파트형 사택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11평형 3층짜리 화광아파트는 화장실을 현관 밖 복도에 두고 있어 건축 면에서도 특이성을 지닌다. 1984년 정선 함백광업소에서 5층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광부들도 도시형 아파트 사택에서 생활하게 된다. 사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광부아파트 건설에 나선다. 광부의 위상을 생각한다면서 ‘광원’으로 호칭을 바꿔 부르더니, ‘광원아파트’ 건립을 지원하고 나섰다. 그러나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준공도 전에 입주 자격을 갖춘 광부들이 탄광촌을 떠나거나, 실직하고 말았다. 공식 명칭이 ‘광원아파트’였으나 입주자를 찾지 못해 일반인에게 분양되고, 아파트 명칭까지 사라졌다.
최초의 광부아파트인 화광아파트는 준공 당시 악단까지 불러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2019년 태백시는 이 유산을 철거하면서 떠들썩한 행사를 열었다. 모두 철거된 자리에다 붙인 ‘탄탄마을’이 그 흔적을 기억할 뿐이다. 문곡과 소도의 ‘광원아파트’는 명칭은 잃었어도 건물이 남아있으니, 유래를 새겨 탄광문화유산의 폭을 넓혀야 한다.

■우물방송과 탄광촌 공동체=사택은 4~6가구가 한 동에 함께 사는 단층 연립 구조였다. 사택 한쪽에는 공동화장실이, 반대쪽에는 공동우물이 있었다. 방음도 안 되는 집에서 새어 나온 소문은 공동우물로 모였다. 이웃 간에 나눈 이야기와 동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를 ‘우물방송’이라 불렀다. 아낙네들은 빨랫거리가 없어도 우물로 모여들었다. 여성을 억압하는 금기가 많은 탄광촌에서 공동우물은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간이었다. 공동우물은 사적 사연을 공유하며 정서적 유대를 나누는 장소이자, 광업소나 사회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하는 언론의 기능도 했다. 탄광 시위 현장에 광부 아내들이 가세하는 것도 우물방송을 통한 공동체 연대와 학습에서 비롯되었다.
탄광촌 사택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다. 광업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생활력을 얻던 공간이자, 노동 계급의 삶과 문화를 담은 역사적 장소이다. 밀집된 탄광 사택이 있었기에 농촌·어촌과 함께 탄광촌이 한국의 대표적 산업공동체 촌락의 한 축을 이룰 수 있었다. 도계읍 일대처럼 원형이 온전한 탄광 사택 마을을 가치있는 탄광문화유산으로 가꿔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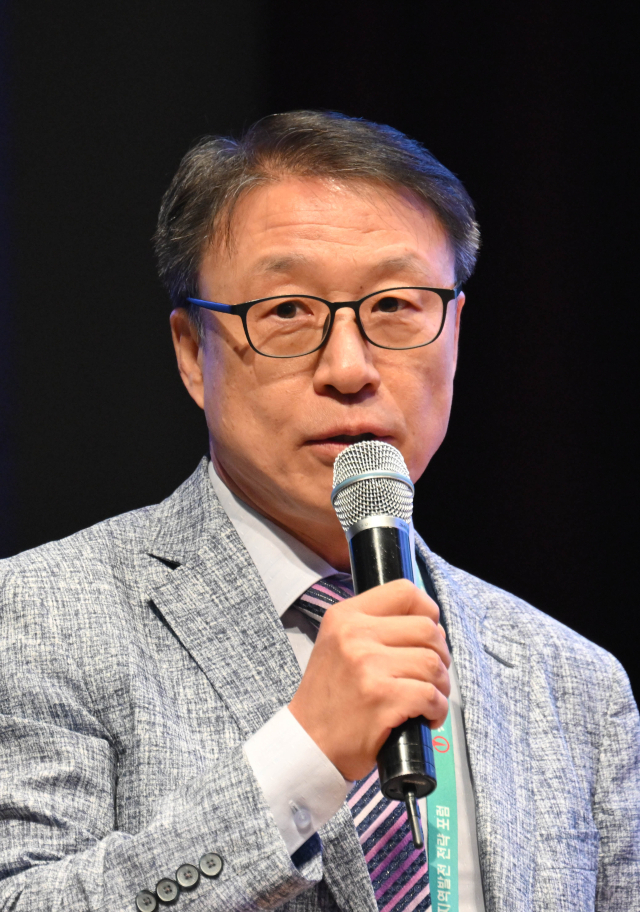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