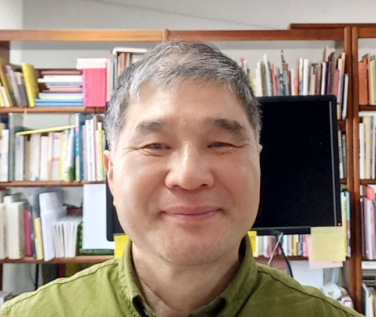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공동체의 붕괴,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고독사는 전국적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은 4,208명에 달했다.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충북보다도 높은 수치로,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 사례는 이 같은 수치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든다.
지난 6월 춘천시 동면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이, 7월에는 신북읍에서 8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이들은 오랜 기간 단절된 삶을 살아 왔고, 사망 이후에도 일정 기간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개인의 죽음 이전에 사회적 연대와 공공 안전망의 실패를 뜻한다. 고독사 증가의 원인을 단순히 고령 인구 증가로 치부해선 안 된다. 복지 정보 전달 체계의 부실,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개입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과 지역사회의 단절이 문제의 핵심이다. 더불어 지자체들은 고독사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개선은 힘들다. 고독사 대응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재정비돼야 한다. 우선, 위기 가구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데이터 전산망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부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돌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고독사 예방 정책이 복지부서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 보건, 주거, 치안,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의 손이 닿기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마을 공동체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복원해 주민 간 상호 돌봄 기능을 회복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때다.
실효성 있는 고독사 예방 정책은 ‘죽음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돼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고독사를 막는 제일 근본적인 처방은 결국 사람과의 연결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을 앞지르고 있고, 산간벽지와 농촌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다. 그런 만큼 선제적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