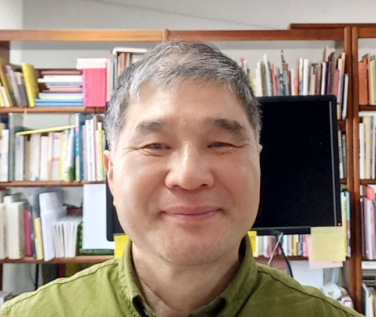오대산 자락에 지난 3일부터 새로이 열린 ‘순례길’은 단순한 탐방로가 아니다. 길 위에 각인된 것은 흙과 바람만이 아니라 천년을 걸어온 이들의 숨결이기도 하다. 월정사에서 출발해 상원사와 적멸보궁을 지나 비로봉과 오대암자에 이르는 발걸음은 수행자들이 구도의 길에서 흘린 땀과 중첩된다. 그 길을 오늘날 다시 걷는다는 것은 유람이 아니라 오래된 신화와 역사를 몸으로 되새기는 일이다. 길은 결국 인간을 담는 그릇이기에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곧 삶을 성찰하는 기도가 된다. ▼옛사람은 길을 두고 ‘도(道)’라 불렀다. 이동의 경로가 아니라 인간이 걸어야 할 삶의 방향을 뜻했다. 공자의 도, 부처의 도 모두 길의 은유에서 시작된다. 오대산 순례길은 산티아고의 길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 뿌리는 우리 땅 깊은 곳에 이미 존재했다. 조선왕조실록이 지켜온 기억과 한강의 첫 물방울이 솟는 시원지, 그리고 자생식물원이 간직한 생명의 서사까지. 이는 곧 한 권의 두꺼운 고전과 같아 한 장, 한 장 발걸음으로 넘기며 읽는 것이다. 길 위의 풍경은 변하지만 그 변주 속에서 불변의 가치가 드러난다. ▼‘수행은 길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순례란 결국 목적지에 닿는 것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행위다. 적멸보궁의 고요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번잡한 세속에서 벗어나 무심히 걷는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을 치유한다. 구간 내 11개소 방문 지점의 스탬프를 찍는 행위조차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한 걸음마다 흔적을 남기라’는 무언의 가르침일지 모른다. ▼오대산 순례길은 결국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 무대다.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작은 구도자가 된다. 흙을 밟는 발끝에서부터 생명의 숨결이 이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그 물음이야말로 진정한 순례의 시작이다.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길 위에서 다시 만나는 나 자신. 오대산 순례길은 그 귀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