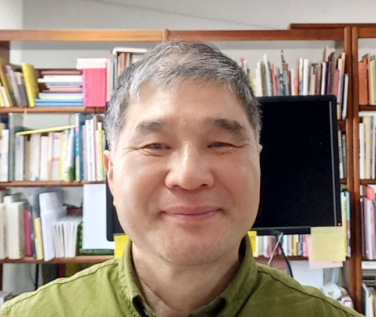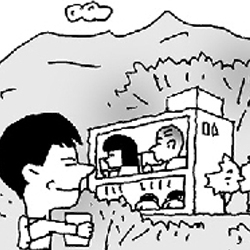
한때 시골 마을의 도서관은 조용한 쉼터이자, 먼 도시의 문화 냄새를 살짝 들여오는 창이었다. 그 문을 열면 책 냄새와 함께 먼 나라의 이야기, 낯선 사상의 바람이 스며들곤 했다. 횡성 공근면의 금계작은도서관이 새로 단장해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는 일이다. 이번 재개관은 ‘공간의 복원’이 아니라 ‘의미의 회복’이라 부르고 싶다. ▼‘독서삼도(讀書三到)’.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는 세 가지 길이다. 금계작은도서관의 불빛 아래, 이 세 가지 길이 다시 열리고 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 노인의 한숨 섞인 회상까지. 그것은 마을의 심장 소리다. 독서율이 곧 나라의 품격이라면, 이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된 책 한 권의 울림이 결코 작지 않다. 책은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더 묻도록 만든다. 그 묻는 힘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힘이다. ▼금계작은도서관은 이름처럼 작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의미는 크다. 군청의 지원과 은행의 후원이 더해져 만들어진 이 장소는 단순한 복합문화시설이 아니다. 이곳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지식의 다리’다. 스마트폰 속 짧은 영상이 하루를 채우는 시대에 활자로 다시 눈을 돌린다는 것은 작은 혁명이다.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처럼, 아이들이 도서관에 드나들다 보면 자연스레 책의 언어를 배우게 된다. 마을마다 이런 도서관 하나쯤 있다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도, 세대 간의 단절도 조금은 완화될 것 같다. ▼금계작은도서관의 문턱은 낮지만, 그 의미는 높다. 새로 칠한 벽보다 다시 찾아온 주민의 발소리가 더 빛난다. 책 속의 삶이 현실을 비추고, 그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도서관은 그래서 ‘공공의 거울’이다. 우리 사회의 품격은 이런 조용한 공간에서 자라난다. 공근면의 작은 도서관이 다시금 불을 밝힌 것은 단지 책의 귀환이 아니라 사람의 귀환이다. 그 불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