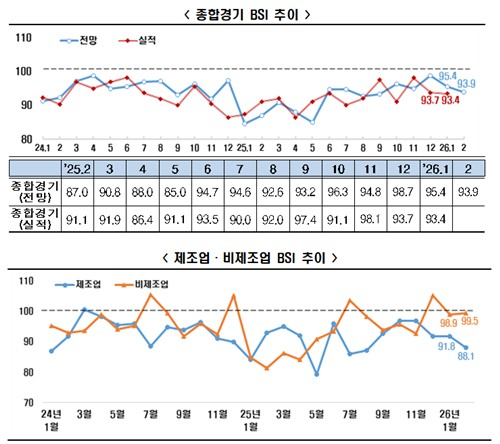지난해말부터 여의도에는 ‘당원주권’이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1인 1표제 논쟁과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권한 강화는 이름은 달라도 사살상 방향은 한 몸이다.
‘당원 주권강화’라는 말은 외견상 그럴싸하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논리는 얼핏 맞아 보이지만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되는 당원이 대의민주주의 전부를 대표할 수 는 없는 것이다.
당원 1인 1표제는 더 달다. 모든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고 참여한 만큼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주권의 ‘당의정’같은 말이다. 문제는 ‘참여’의 대상과 범위에 있다. 정당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은 균질하게 대표성을 가지지 않는다.
정당의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와 투표를 하는 대상은 이념적, 지역적, 연령적, 직업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는 게 아니라 조직화 된 소수가 대부분이다. 그 소수는 정치적 성향이 강경하고 선명한 노선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 강성당원들이 한국정치와 전체 유권자를 대변한다는 건 ‘정치과잉’이다.
양대 정당에서는 1년에 3~6개월 동안 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민주당)과 책임당원(국민의힘) 지위와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들이 낸 당비의 총합은 거대 정당에선 연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은 더 많다.
또 경상보조금과 선거 때 받는 선거보조금에 15% 이상 득표했을 때 받는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있다.
당 운영에 돈을 댄 것은 당원이 아니라 일반국민 정확히는 전체 납세자라는 뜻이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당비 1000원을 내는 수십만명이 수천만 유권자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당은 각급 단위의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대선이라는 가장 큰 단위의 선거에서 정권획득이라는 대의를 실현시킨다.
그래서 당원이 중요하다. 각급 단위의 선거 지방선거, 총선거, 대선 등에서 그 당의 얼굴로 출마하는 후보를 당원이 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당원들이 포진돼 있느냐에 따라 당의 대표선수들이 정해지고 바뀔 수 도 있다.
당내 공천 경쟁의 기준이 지역 민심이나 본선 경쟁력이 아니라 누가 더 강성당원의 지지를 받느냐로 이동하면 당의 방향성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한다. 인물과 메시지가 중도로 확장 되기 보다 내부 결집을 향해 수렴되고 일반 유권자보다 당원을 먼저 의식하게 된다. 출마명분과 선거전략이 ‘국민설득’에서 ‘당원관리’가 우선할 수 밖에 없다.
바야흐로 당원정치의 시대가 도래한 듯 싶지만 ‘당원주권’ 구호는 사실 만들어진 것에 가깝다.
2000년 들어 불기 시작한 ‘팬덤정치’가 이 흐름에 에너지를 불어 넣었고 이 힘을 간파한 정치인들이 ‘당원=당의 주인’이라는 논리를 시대정신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민주당의 1인1표제 논쟁은 이미 불이 붙었고 2월안에 처리될 것 같다. 민주당은 이미 조직화된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큰 정당인데 1인1표제가 정착되면 당원 충성도와 강성 이슈에 대한 함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역시 최근 당원숫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홍보 하는데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모집한 당원도 있겠지만 그 숫자에는 당의 정체성 강화를 요구하는 당원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63만 당원, 국민의힘 35만 당원이 전체 당원과 국민을 과다대표하면 그 선택을 받는 후보는 당심에는 가까워져도 민심에는 멀어질 수 있다.
산거의 법칙하나 소개한다. 당내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의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가 승부를 가른다는 점이다.
정당은 당원과 지지층으로 출발하는 집단이지만 그들의 요구만 소화하는 플랫폼이 아니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향성을 가질 때 비로소 ‘집권여당’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