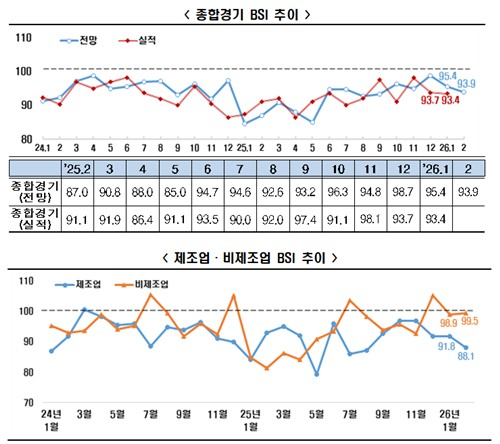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지속가능’이란 말은 종종 환경이나 경제에만 얽매인다. 그러나 이 단어가 본래 지닌 무게는 훨씬 무겁고, 넓으며 또 깊다. 무너뜨리지 않고 이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그 틀 안에 들어간다. 선거정국 속 정치는 지금 그 ‘지속가능’의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정당성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 눈치만 본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하루살이 공약과 단기 이익의 유혹 속에서 진짜 지속 가능성은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닐까. ▼문화는 사회의 심장박동이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 뛰고 있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그런데 최근의 정치권은 이 심장을 ‘흥행’이나 ‘지역 민원’ 수준으로 축소시키려 한다. 공연장은 ‘퍼주기’의 대상이 되고, 예술인은 ‘표밭 관리’의 도구가 된다. 문화 정책이 아닌 문화 행사를, 비전이 아닌 이벤트를 앞세우는 태도에서 어떤 지속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형의 가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면, 공동체는 결국 숨을 잃는다. ▼이번 선거는 정치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체력을 가졌는지를 묻는 시험이다. 지금껏 문화는 뒷전이었고, 환경은 미룰 수 있는 과제로 취급돼 왔다. 복지와 지역균형은 매번 선거철만 되면 소환되는 단골 메뉴였다. 이런 임기응변식 정치는 그 자체로 지속 불가능하다. 공약은 유통기한이 짧고, 정책은 이벤트로 소모된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들 말하지만, 정작 그 방향을 끝까지 지켜낼 의지를 가진 정치인은 드물다. 변화는 외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지지율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치를 선택할 때다.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곧 ‘계속 살 수 있음’이다. 그리고 그 ‘살아 있음’의 조건에는 문화가 반드시 포함된다. 전통을 지키되 시대를 읽고, 정책을 짜되 가치를 묻는 정치는 결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사전수전 다 겪은 유권자의 눈은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졌다. 누구를 뽑느냐 이전에, 무엇을 이어갈지를 묻고 있다. 이 질문 앞에서 정치는 피하지 말고 정책과 공약 그리고 실천으로 답해야 한다. 오석기 문화교육담당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