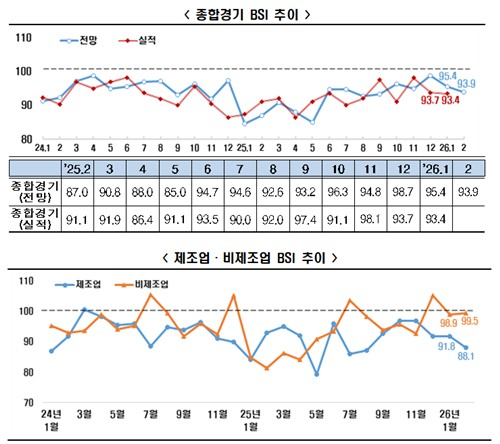시골 어느 곳을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농막이다. 농막의 개념은 19세기 말 독일의 ‘작은 정원’에서 시작됐다. 당시 독일 농촌운동을 주도한 슈레버 박사가 환자 치료에 주말농장을 도입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심신을 치료할 것을 권장하면서부터다. 이후 슈레버가 제안한 작은 정원은 슈레버가르덴 또는 클라이가르덴으로 불리며 독일에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농막은 1998년 농막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통지라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등장했다. 농업인만 설치가 가능하고, 전기 수도시설 설치와 상시 거주를 금지하는 등 규정이 까다로웠다. 2012년 정부의 규제개선으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설치기준은 2층 구조, 테라스·데크설치, 잡초방지 용도의 포석깔기·시멘트 타설, 잔디심기 등을 금지했다. 주택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규제가 있으면 편법이 있기 마련이다. 다락방을 만들고, 테라스를 지붕위에 설치 하는 등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시공이 많아졌다. 대다수 국민들은 농막을 휴식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반면 정부는 농작업에 필요한 창고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가치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농막은 규제 대상이다. 용도, 면적, 주거가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법 증축, 별장으로 사용 등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먼저 나선 곳은 감사원이다. 지난해 홍천군 등 20개 지자체에 위치한 농막 3만3,14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1만7,149개가 불법증축 및 불법전용된 것을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농막 규제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았다. 농지 면적과는 상관없이 연면적 20㎡ 이하의 농막의 크기를 농지 면적별로 차등화했다. 농지면적 660㎡(200평) 미만은 7㎥(2평)이하, 그 이상의 경우 13㎥(4평)로 농막 면적을 축소했다. 또한 숙박금지와 내부 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로 제한, 데크·테라스·다락·정화조 등 부속 시설도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개정안이 발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7㎥(2평)짜리 농막에 휴식공간을 25%로 제한하면, 1.75㎥(0.5평)에서 어떻게 쉴 수 있냐’, ‘주말농장을 경영하려면 농막에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휴식하고 잠자고 해야하는데 무슨 법이 잠자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규제를 하느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윤 대통령의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철회됐다. 이 차에 농막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농막의 면적 등 각종 규제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합리적인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농촌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농막을 활용하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 생활인구는 올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경우 생활인구로 간주된다. 생활인구가 늘어나면 지역에서 소비도 함께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자명하다. 농촌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의 빈 자리를 생활인구로 메울 필요가 있다. 농막도 생활인구 개념에 포함시켜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인구는 경쟁력이다. 정주인구 못지 않게 생활인구도 정부의 각종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농막을 규제대상만이 아닌 농촌인구로 유도하는 정책적 활용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