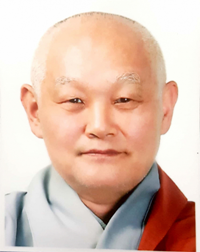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는 마음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12월5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재단이 주최한 ‘민주주의 포럼’에서 한 말이다. 그는 그 말 뒤에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뤄낸 나라로 찬사를 받아 왔다. 최근엔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어려움과 퇴행을 토로하는 연설에 예시로 등장한 것이다. 그 예시가 21세기 12월의 어느 날 밤에 느닷없이 떨어진 비상계엄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난 70년간 온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온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진 셈이다.
우리는 지난 1월1일, 희망으로 가득 찬 갑진년을 맞았다. ‘푸른 용’의 해라며 여느 해와는 다른 큰 기대를 품었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처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참담한 결과를 맞고 말았다. 그 누가 이런 귀결을 상상이나 했을까.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은 또 국민대로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모든 일이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잘 정리되어 다가오는 을사년을 희망 속에서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의 와중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식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신문 1면을 장식했을 노벨문학상 수상식 소식이 안타깝게도 다소 뒤편으로 밀린 감이 든다.
이번 한강 작가의 수상식 모습이나 그가 한 연설은 인간과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으로 남기 위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소회는 소승만의 것은 아니리라는 생각이다. 검은 드레스를 입고 세계의 석학들과 함께 자리해 문학과 역사와 삶을 이야기한 한강 작가의 모습으로 그나마 위안을 얻는다.
옛말에 ‘진사(辰巳)에 성현출(聖賢出)’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갑진(甲辰), 을사(乙巳)에 훌륭한 성현이 등장한다는 말인데, 아직 그 결과는 알 수 없으나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 부디 바라건대 이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지혜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이 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거친 파도를 피할 수 없다.
어느덧 2024년도 며칠 안 남았다. 돌아보면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한 해였다. 그래서 그런지 오대산 서쪽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이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힘들고, 청년들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안타까운 세모(歲暮)다.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이다. 1905년 일본의 강압으로 체결된 을사늑약 때문에 ‘을사’라는 글자가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만, ‘푸른 뱀’의 기운이 서린 범상치 않은 해다. 지난 일 년의 어지러웠던 일들은 동지 팥죽 한 그릇으로 삼켜버리고 새 희망을 품어볼 일이다. 늘 그래 왔듯이 대한민국은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DNA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