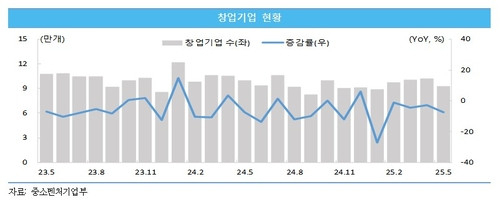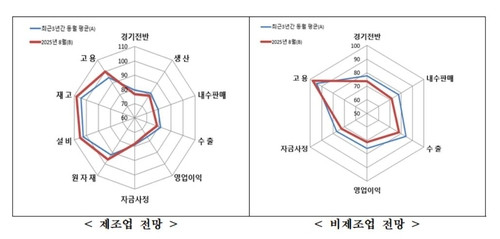바캉스는 프랑스어 ‘Vacances’에서 유래한 단어로, 1960년대 프랑스 특파원들이 8월 파리 거리가 텅 빈 이유를 ‘바캉스’로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바캉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이다. 바다, 계곡, 산 그곳이 어디든 뜨거운 여름 잠시나마 치열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쉼의 공간으로 가는 것이 바로 바캉스가 아닐까? 바캉스의 어원인 라틴어 Vacatio가 무언가로부터의 해방이자 쉼의 의미라는 점에서도 일맥상통한다. 과연 우리에겐 어떤 ‘쉼’이 필요할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름을 다스리는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조선의 선비들은 한여름에도 붓을 놓지 않았다. 계곡 물에 발을 담그고 책을 읽는 ‘탁족(濯足)’은 그들만의 피서법이자 정신 수양이었다. 오늘날 리조트의 인피니티풀과 별반 다르지 않다. 비싼 숙소나 이국적 풍광이 없어도 한 권의 책과 시원한 물가가 있다면 그것이 곧 최고의 피서지다. 그 자체로 고귀하다. ▼과거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읽었다고 소개된 도서목록은 공개 즉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오르며 침체한 출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읽었다고 소개한 ‘명견만리’가 그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 중 하나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베스트셀러 목록을 많이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오히려 책 속에서 그늘을 찾는 사람들. 읽는 행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 쌓이는 것이다. 번잡한 일상을 밀어내고 조용히 마음을 채우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얻는다. ▼여름휴가는 단지 떠나는 일이 아니라 돌아올 자리를 다시 생각하는 일이다. 멀리 가야만 하는 것도, 비싸야 의미 있는 것도 아니다. 뜨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를 다시 묻는 시간. 그것이면 족하다. 계곡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 한 권에 마음을 씻는 여름. 그 조용한 사치는 바캉스의 원형이며, 어쩌면 우리 삶이 지향해야 할 태도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