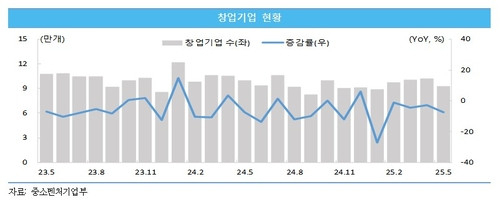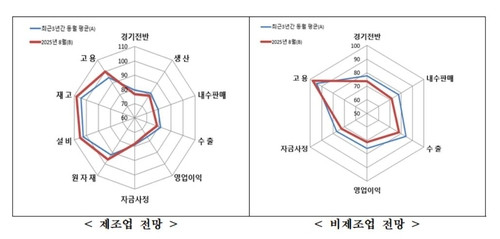더워도 너무 덥다. 전 국토 면적의 98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고 한다.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도 모자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 발효되는 초열대야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1995년 7월 셋째 주, 체감온도 52도에 달하는 폭염이 미국 시카고를 덮쳤다. 본래 시카고가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지만, 이 정도로 전례 없는 폭염은 도시 기능을 마비시켰다. 폭주하는 전력량으로 도시 전체가 며칠간 정전됐고, 한증막이 된 집 밖으로 피신한 시민들이 소화전을 여는 바람에 수도 공급도 끊겼다. 그럼에도 시 정부는 폭염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판단해 총력 체제를 가동하지 않았다. 결과는 참혹했다. 7월14일부터 한 주 동안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시카고 시민은 485명에 달했고, 입원 환자도 1,000명을 넘었다. 시체안치소 밖에는 자리 없는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기 위해 냉동 트레일러가 줄지어 주차됐다.(에릭 클라이넨버그 ‘폭염 사회’, 글항아리 간, 2018년) ▼이 책은 1995년 여름에 관한 사회학적 보고서다. 희생자 다수는 임대 아파트나 원룸에서 홀로 거주하던 노인이었다. 쥐꼬리만 한 연금을 제외하면 그들에 대한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슬럼화된 옛 동네에 홀로 남은 노인은 낯선 이웃들과 단절되며 공포에 떨다가 전기와 수도가 끊긴 좁은 방에서 숨을 거뒀다. 저자는 사건이 특정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 우리와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외면할 정도로 남의 일이 아니다. ‘가마솥더위’, ‘찜통더위’ 등의 표현을 쓰며 호들갑만 떨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시민 각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터전 주변에서 ‘에너지 빈곤층’의 존재를 확인해 보고 함께 더위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한다.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도 있지만, 어느새 하늘은 가을이 멀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