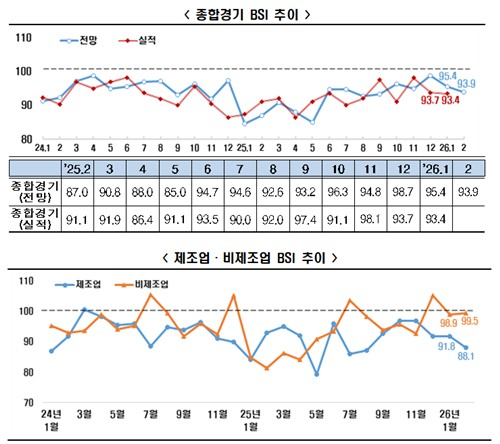어느 날, 바람이 먼저 지나간 길을 보았다. 풀잎 하나 누이지 않았고,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은 그 길의 이름은 아직 없다. 우리는 그 무명의 방향으로 종이 한 장을 펼친다. 물결처럼 너울지는 산의 등성이 위에,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시간들 사이에, 가장 먼저 눈을 뜨는 글자가 되기 위해.
아무도 오지 않은 곳엔 침묵이 깃든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직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들의 무게다. 우리는 그 무게를 품고,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언어보다 오래된 진실이, 사람보다 깊은 시간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늘 바깥의 땅이었다. 그러나 바깥이란, 중심을 품은 가장 깊은 안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간다. 누구의 뒤도 아닌, 우리의 처음으로.
신문이 하루의 기록이라면 우리는 그 하루를 내일로 건네주는 여명의 다리 하나 놓고자 한다. 폭풍이 지나간 산자락에 핀 민들레 한 송이처럼, 낮고 고요하게 존재하는 글이 되려 한다.

먼저 깨어 있는 이들의 옆에서, 소란보다 고요를, 속도보다 방향을 믿으며, 우리는 걷는다.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묻는 길.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처음’이 되기를 택한다. 길이 없으면, 새롭게 발자국을 새긴다. 그렇게 매일, 길을 만든다.
이 한 장의 지면이 시작을 기다리는 이들의 설레는 출발선이기를, 지나온 발이 아닌 다가올 걸음을 위한 여백이기를. 강원일보는 오늘도, 길이 되기 이전의 순간에 선다. 우리의 문장은 그곳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