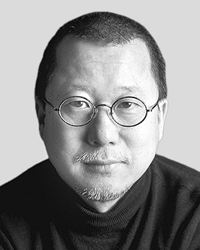
미국 간 아들이 십년 만에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 아들이 낯선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고 뿌리를 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새삼 애틋하면서도 대견하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자양분을 취하고 떼어가지만 그럼에도 애틋하고 안쓰러워지는 것은 피의 이끌림 탓이다. 가족은 서로에게 어둠 속의 검은 개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생각한다. 가족이란 보호색 안에 있을 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족 울타리 밖으로 사라진 뒤 그의 존재감은 또렷해진다.
우리는 가족이란 역사 안에서 자라나는 상처다. 그럼에도 가족을 향한 정이 애틋하고 떨어지면 서로를 그리워한다. 가족 공동체가 우리가 누린 안녕과 보람과 기쁨들의 요람이고, 추억이란 상징 자본이 가족 내부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이리라.
우연히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를 읽으며 가족의 의미를 곰곰 되새겨 본 적이 있다. H마트는 미국 내 한국인이 드나드는 한식 식재료를 파는 식료품점이다.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자란 '나'의 식성은 완전한 한국식이다. 모녀는 생긴 건 다르지만 한식이라는 정서적 탯줄로 단단하게 연결돼 있다.
'나'는 딸에게 결코 '호밀밭의 파수꾼'을 권하거나 롤링스톤스 레코드판을 권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 어머니는 한식을 사랑하고 그걸 만들어 가족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한국인 어머니를 잃은 뒤 '나'는 상실에 따른 그리움을 앓는다. 어머니가 생시에 즐겼던 음식이 그를 향한 추억과 그리움의 끄나풀이 된다. 어머니는 '나'에게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애하지 말라고 주야장천 이른다. "너한테서 항상 김치 냄새가 날 거야. 그 냄새가 네 땀구멍으로 배어나올 테니까"라고.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한국과 연결된 끈이 덧없이 끊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술과 담배와 노름'을 좋아하는 할머니와 찜질방을 즐겨 찾는 이모들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한국 풍습과 문화를 그리워한다. '나'는 그때마다 김치를 담거나 한식을 만들어 먹는다. 'H마트에서 울다'는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애도를 담은 책이자 자기 안에 인 박인 입맛과 문화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는 책이다.
가족은 백악기의 암석들로 이루어진 달과 다르다. 가족이란 피의 기질과 본성을 공유하고 서로 닮은 식성과 욕구를 가진 존재로 산다. 그런 바탕에서 나를 당당하게 호명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일에 징집한다.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물어뜯는다. 오죽하면 아무도 안 볼 땐 어딘가에 갖다 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라고 했을까. 많은 이들에게 가족은 살아야 할 목적이자 동력인 동시에 내다 버리고 싶을 만큼 성가신 짐이다.
인류학적으로 가족은 유전자와 삶의 기억에서 하나가 되는 혈연 공동체다. 우리는 가족 내부에서 엄마의 자장가를 들으며 잠 들고, 공동으로 슬픔과 기쁨을 겪으며 성장한다. 우리는 그런 가족 안에서 자라면서 자아를 빚은 존재들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구속한다. 이 구속이 늘 즐거움과 보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더러는 구속에 진절머리를 치며 벗어나기를 열망한다. 하지만 가족 울타리를 벗어나 탈출하는 것은 어른이 된 뒤의 일이다. 자식들은 노인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와 결혼과 출산을 거치며 새 가족을 꾸린다. 그러나 새 가족도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진 다음엔 빈 둥지로 남는다. 가족의 결속력과 의미가 예전보다 퇴색했지만 가족이란 여전히 생성과 해체를 반복하며 인류를 지속가능하게 떠받치는 토대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