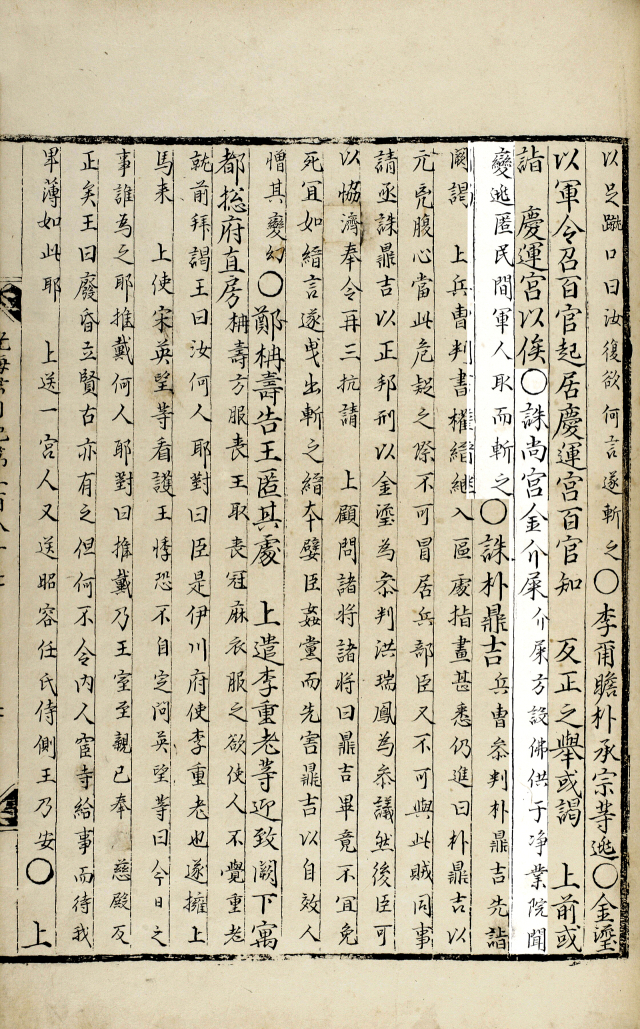
선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 중에는 “내가 살아 있을 때처럼 동기(同氣)를 사랑하라(광해군일기[중초본] 66권, 광해 5년 5월 15일)”며 나이가 어린 영창대군을 아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광해군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3년이 되는 해(1611년)에 아버지가 남긴 유훈에 따라 배다른 동생인 이의(李㼁·영창대군의 이름)를 대군(大君)으로 봉하는 등 예우를 갖춘다. “선종(宣宗)의 아들 이의(李㼁)를 봉하여 영창 대군(永昌大君)으로 삼았다.(광해군일기[중초본] 48권, 광해 3년 12월 26일)” 당시 영창대군의 나이는 여섯 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치 세력의 암투가 횡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창대군의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광해군의 비선실세 김개시, 간신 이이첨 등의 눈에는 왕권 강화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김개시는 이를 위해 계략을 꾸민다. 1613년 벌어진 ‘계축옥사’가 그 것. 계축옥사는 인목대비와 그의 아버지 김제남(연흥부원군)이 광해군을 제거하고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운 사건이다. 한 강도사건(은상 살인 강도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범인으로 잡힌 박응서는 옥중에서 광해군에게 올린 상소를 통해 “우리들은 천한 도적들이 아니다. 은화(銀貨)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반역하려 하였다(광해군일기[정초본] 65권, 광해 5년 4월 25일)”고 거짓 자백한 것이다.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고 인목대비에게 수렴청정을 맡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까지 했다. 이 일로 역모 혐의를 받던 김제남은 사약을 받아 세상을 떠나고 영창대군은 폐서인 된 후 강화도로 유배를 당한다. 김개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목대비가 유배 떠난 영창대군을 복권시켜 역모를 꾸민다는 누명까지 씌운다. 끝내 영창대군은 작은 골방에 갖힌 채 뜨거운 증기로 쪄서 죽이는 ‘증살(蒸殺)’을 당한다. 이를 두고 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계축년 옥사는 말하기도 참혹합니다. 당초 흉악한 역적 무리가 김제남에게 극형을 가하려 하고, 또 대군(영창대군)과 자전(인목대비)까지 해치려 하여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전하기 어려웠습니다.…이는 대론(大論·폐비론)의 시작이었습니다.(인조실록 14권, 인조 4년 12월 4일)” 이 사건으로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사이는 급격히 냉각된다. 급기야 1618년 광해군은 자신의 어머니 인목대비를 폐위하기에 이른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긴 인물이 바로 김개시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추상같은 권력도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었다. 1623년 인조반정에 의해 광해군은 왕좌에서 끌어 내려진다. 김개시는 이때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서 정치적 줄타기를 한 것 처럼 반정세력의 편에 서는 배신을 한다. 하지만 반정이 일어난 당일 김개시는 군인들에게 잡혀 목숨을 잃고 된다. “상궁 김개시를 베었다.[개시는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가 민가로 도망쳤으나, 군인들이 잡아다가 참수했습니다.](광해군일기[중초본] 187권, 광해 15년 3월 13일)” 그렇게 그의 비뚤어진 권력욕은 하루 아침에 박살나 버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