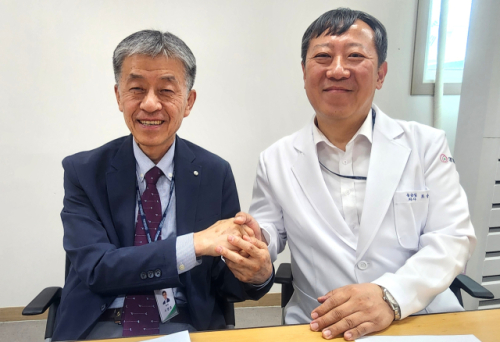하루가 다르게 땅 위 세상은 바뀌었다. 탄소 중립을 외치고, 미래 에너지를 말한다. 그러나 땅 밑은 조용하기만 하다. 까맣고 축축한 그곳에서 곡괭이로 반세기 넘도록 몸을 구부려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빛바랜 작업복을 벗는다. 2025년 6월, 대한민국 석탄산업의 마지막 국영탄광이 폐광된다. 이는 단순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아니다. 한 세기 동안 조국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러나 이름 없이 사라져야 했던 사람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다. ▼고려 말기 공민왕은 ‘정동행성’에 맞서 싸우던 장정들을 위해 특별한 날을 지정, 그들의 헌신을 기렸다. 나라를 지킨 이는 장수가 아니었고, 짐을 짊어진 무명이었다. 은퇴 광부와 가족, 주민들이 ‘광부의 날’을 외치는 목소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검은 꽃’으로 불렸던 광부들의 삶은 산업화의 뒤안길에 처박혀 있다. 이들은 땅속에서 태어나고, 땅속에서 일하다, 땅속에 묻혔다. 진폐로 헛기침만 하던 아버지, 한겨울에도 고무신에 양말 둘둘 말던 아이들, 탄가루에 절어버린 마을. 눈부신 성장 이면에 깔린 어두운 풍경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쓸모가 없어진다. 석탄산업이 끝났다고 해서 광부의 이름까지 지워져야 하는가. 하루도 쉼 없이 갱도를 오르내리며 조국의 공장 굴뚝을 돌게 한 사람들이다. 발전소의 불빛이 꺼지지 않게 만들고, 기차를 달리게 하고, 가정마다 따뜻한 연탄을 지피게 한 손들이다. 국가는 이들의 땀을 기억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광부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생존자의 삶을 품는 최소한의 예의다. ▼광부들은 영웅도 신화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다. 흙과 피가 섞인 탄가루 속에서 피어난 한 세기의 노동, 그 눈부신 고통을 국가가 기록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억하겠나. 산업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다. 이름이 불려야 역사가 된다. ‘광부의 날’은 그 시작이자, 최소한의 응답이다. 더 늦기 전에 광부들의 이름을 땅 위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