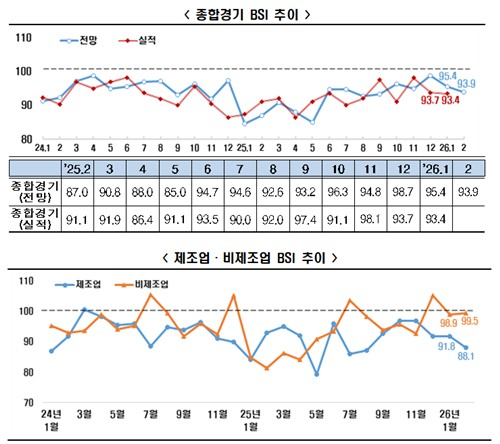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그가 속한 조직의 품격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다. 상황에 따라 어떤 언어는 존재를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하고, 타인을 베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한 고위 간부가 뱉어냈다는 그 설화가 도내 정가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도교육청 A국장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도의회를 겨냥해 “교육의 ‘교’ 자도 모르는 자들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교육장 등 200여명이 모인 내부 평가회 자리였다고 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 예산 800억원가량을 삭감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조직 입장에서 예산 삭감은 뼈아픈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방식이 ‘상대방에 대한 멸시’로 표출됐다면, 이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발언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거친 표현 때문만이 아니다. 그 속에는 ‘교육은 우리가 전문가’라는 배타적인 엘리트주의와, 도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비민주적 사고가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권은 도민이 의회에 위임한 신성한 권한이다. 삭감의 칼날이 아프다면 그 논리에 대해 치열하게 반박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간부는 이미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의회와 마찰을 빚어 퇴장 조치까지 당했던 터라, 이번 발언은 우발적 실수라기보다 누적된 오만의 발로로 읽힌다.
도의회는 즉각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연한 수순이다. 교육 자치는 교육청 홀로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호흡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머리를 맞대는 협치 위에서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 “교육의 ‘교’ 자도 모른다”는 비난은 결국 협치의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도교육청은 ‘와전’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발언의 진위를 가리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허물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신뢰의 붕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 속 아이들과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교육 행정가는 ‘교육’이라는 단어의 무게만큼이나 자신의 ‘언어’가 갖는 무게를 견뎌내야 한다.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소통이다. 교육의 ‘교(敎)’ 자를 논하기 전에,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공(公)’ 자의 의미부터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