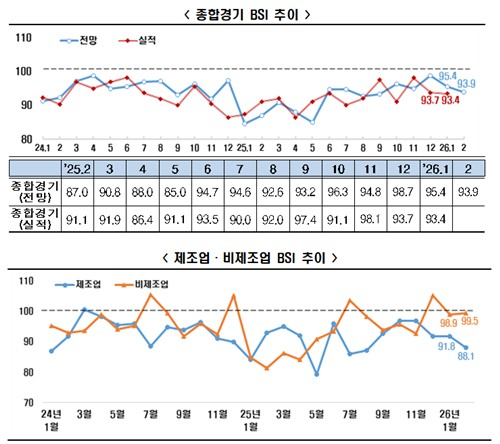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반도체산업의 성패는 첨단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어떻게 양성·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놀랍게도 41년 전 발행된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이다. 1983년 1월20일자 신문에는 ‘半導體(반도체)산업, 한국의 現場(현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은 대졸 이상 1,300여명, 이 중 외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했거나 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인력은 10여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64K DRAM(D램) 도전’의 고비에 놓인 시점이었다. 뒤늦게 반도체산업에 뛰어든 입장에서 자본이나 비전이 아닌,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1983년 삼성전자가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상용화 시대를 열었다. 1986년 1메가 D램, 1988년 4메가 D램, 1989년 16메가 D램을 차례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 나갔다. 16메가 D램 분야에서부터 기어이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았다. ▼1992년에는 64메가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정상에 섰다.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50%를 차지하는 미국에 이어 14%로 2위에 랭크됐다.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PC와 인터넷, 스마트폰, 서버·데이터센터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최근 원주에서 특강을 통해 “내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700조원 이상 넘어설 것”이라고내다봤다.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인력은 2021년 17만7,000명에서 2031년 30만명을 훌쩍 웃돌 예정이다. 더욱이 현재 추세로는 7만7,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주에서 문을 연 한국반도체교육원이 중요한 이유다. 이곳을 통해 배출되는 ‘반도체 워리어(전사)’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핵심 인재로 자리하고, 원주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걸음마를 시작한 반도체산업의 중추적 멤버로 함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