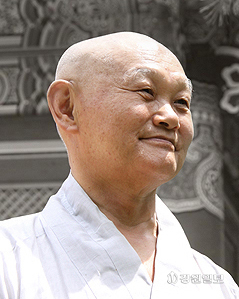
지난해 가을,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쾌거에 온 나라가 환호했다. 여와 야가 없었고, 진보와 보수도 없었다. 그날부터 한강 신드롬이 펼쳐졌다.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은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도배됐다. 2010년 법정 스님 입적 후 베스트셀러 순위 대부분이 스님의 책으로 채워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그동안 침체해 있던 우리나라 문학 출판이 다시 꽃을 피우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얼마 전 발표된 한 통계에 따르면 문학 출판 시장이 노벨문학상 수상 전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고 한다. 물론 윤석렬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반짝 특수가 너무 짧다. 노벨문학상이라는 비(雨)가 내려 척박한 대지에 문학의 새싹을 피우리라는 장밋빛 기대는 단 몇 달 만에 사라지고 말았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렬 대통령을 파면했다. 많은 국민은 이번 파면으로 오만과 불통의 정치가 끝나고 새 민주주의가 시작될 거라며 환호했다. 과연 그럴까?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같은 일이 되풀이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 8년 동안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리더십은 와해했으며, 그로 인해 중산층 이하의 불만은 켜켜히 쌓였다. 그 결과 우리는 8년 전으로부터 단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채 다시 반환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평가도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이후 출판 시장이 더 쪼그라든 것이나 8년 전 대통령 파면 사태가 다시 되풀이된 것은 모두 ‘성찰’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찰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일을 반성하며 깊이 살핌’이다. 우리는 반성하고 살피는 대신 그냥 떠들썩하게 환호만 했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아는 대로다.
우리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우리 문학의 척박한 현실을 성찰해야 했다. 거의 모든 문학 서적이 초판도 소화하지 못한 채 창고로 들어가는 현실, 입시 지옥인 학교에서 문학책은 금서(禁書)나 마찬가지인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문학이 죽은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근 문학 시장이 더 커졌다는 통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8년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해야 했다. 사회의 총체적인 개혁과 함께 민주주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정권교체에만 머물다 보니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중세 이후 수백 년에 걸친 성찰 덕분에 오늘의 문화를 이루었다. 때로는 피 흘리고, 때로는 다시 구체제로 복귀하기도 했지만, 끝임없는 성찰을 통해 오늘의 문명을 이루었다. 성찰을 통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국민은 손쉬운 대안, 즉 포퓰리즘이나 극단적인 좌우 편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부처님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깨달음은 자기 반성에서 시작된다"라고 설파했다.
그뿐만 아니라 ‘반조(反照)와 참선(參禪)’을 강조했는데, 반조는 반성적 성찰을, 참선은 통찰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과 AI 파도, 또,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선거로 인해 우리나라 상황이 8년 전보다 더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이 있다. 그 때문에 차기 정부의 영순위 정책을 경제에 두는 이가 많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반성적 성찰의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