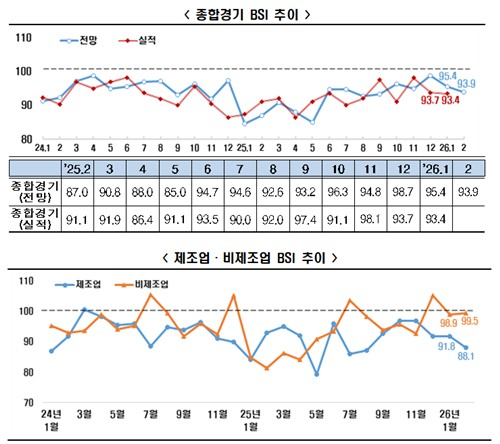원주시가 추진 중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은 도심과 읍·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기반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뜻깊은 시도다. 특히 문막읍과 부론면 등에서 자발적으로 학생 교육과 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주민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시가 나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방침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대체로 외곽 지역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과 후 돌봄과 학습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다. 원주시가 이번 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요 기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은 공동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도시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교육이나 체험학습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과목 보완형 학습, 인문·예술·체육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의 제공은 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마을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일수록 아이들이 지역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과 학습 동기를 얻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마을교육공동체가 단발성 행사나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재정과 인력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산이 연도별로 달라지거나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활동 주체들의 참여 동력이 쉽게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 기반 위에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와 학부모, 마을 리더, 교육청 등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채울 수 있다. 또 효과 측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학습 효과, 정서 발달, 지역 유대감 형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성과 중심이 아닌 과정을 중시한 평가 체계를 통해 진정한 교육 생태계로 성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