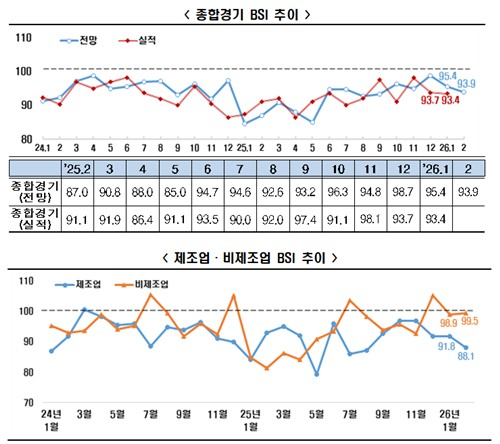청년 실업이 ‘고질병’처럼 굳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통해 구직급여 지급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청년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특히 강원자치도 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도내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대비 4,000명(3.9%) 증가한 10만8,000명으로 역대 하반기 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10년 전인 2014년(8만1,000명)보다 2만명 넘게 급증했다. 취업 준비생도 1년 새 30%가량 줄어든 9,000명으로, 1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도 속출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 비경제활동인구 43만6,000명 중 41만4,000명이 ‘취업희망을 안 했다’고 응답했다. 취업 희망자는 전년보다 20.8% 감소한 2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7년 이래 가장 적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취업희망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청년들이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자리 자체에 대한 기대를 접었으며, 이는 단순한 실업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좌절감의 표현이다. 또 학자금 대출 체납도 급증하고 있다. 2024년 강원자치도 학자금 대출 체납액은 15억5,700만원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보다 77%나 늘었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구직급여 등 청년정책 확대를 공언한 만큼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단기적 처방에 머문다면 청년들의 실질적 삶을 바꾸기엔 부족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금 확대를 넘어선 일자리 구조의 개선이다. 강원자치도는 태생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다. 지역에 남아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청년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는 청년 맞춤형 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과 관광, 바이오 산업 등과 관련한 지역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결된 산학협력,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 투자는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숨통을 틔워야 하고, 자치단체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