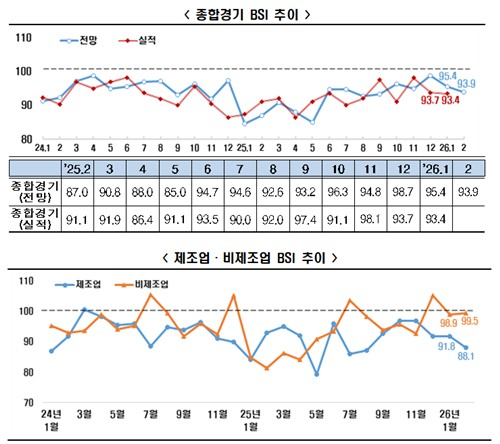최근 국회에서 열린 첫 입법박람회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중차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에서 형성된 재원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구조 조정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데 핵심이 되는 담론이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일부 낙후지역만의 사안이 아니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소멸’의 서막이 될 수 있다. 박람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지방소멸은 수도권 과밀 경쟁과 출산율 저하까지 이어지는 국가소멸의 문제”라는 발언은 그 심각성을 정확히 짚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은 단지 인구 유출을 막는 것뿐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입법박람회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권의 진지한 문제 의식이 반영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재정의 선순환 구조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시 지역 재투자 성과를 평가해 이를 반영하고, 한국형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지방이 강해지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지역 자본의 지역 내 순환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현재 지방금융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금융기관 본사로 회수되고 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지역 산업이나 주민 복지로 연계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간다면, 지방은 점점 ‘고갈되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지역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단위의 투자회사 및 재투자기금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도 지방소멸 대응에 있어 중요한 과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광역의회 의장들과 국회의장이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협력을 다짐했으며,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은 단지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정책의 전 과정에서 공동의 역할을 설정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자리 잡을 때 지역 문제는 비로소 지역 안에서 해결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