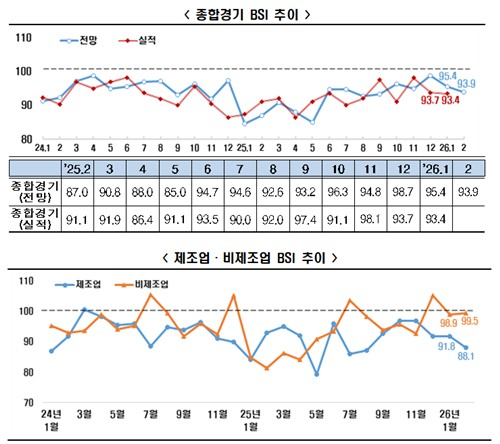강원인 10명 중 8명 이상이 1년 사이 계층 이동을 이루지 못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은 강원인 다수에게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며, 사회적 정체와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경고 신호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소득분위 이동성은 31.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고, 소득 상승 이동률은 16%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고소득층(5분위)의 유지율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저소득층(1분위)도 75.3%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즉, 상위 계층은 떨어지지 않고 하위 계층은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도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직된 구조는 도의 지역적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도는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청년 일자리나 사회적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미약하다. 도내 청년층의 계층 상승 이동률은 23%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지만, 1분위 탈출률은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해 38.4%에 머물렀다. 이는 잠재력 있는 청년층조차 가난을 탈출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노년층의 이동성이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분위 이동성은 고작 25% 수준이고, 저소득층 유지율이 가장 높다. 기초연금과 공적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현실에서, 노년층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냉혹한 결과다. 이는 단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 복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불균형 구조를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우선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시급하다. 도가 추진 중인 전략산업 육성, 지역 특화형 벤처펀드 운영, 디지털 농업·에너지 산업 등의 기반 위에 청년 참여와 창업 지원을 연결하는 종합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별로 맞춤형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 계층 상승 가능성을 열어줘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노년층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 기존 기초연금제도만으로는 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 농촌 노인의 경우 공공일자리 확대나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소득 창출 프로그램, 의료복지 강화 등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식의 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