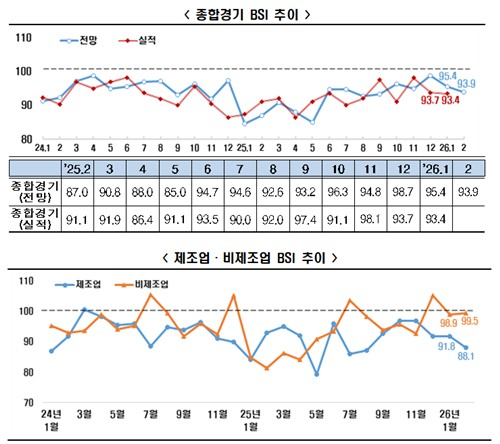강원특별자치도 내 22곳의 권역·지역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 강원대 어린이병원뿐이라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이는 단순한 의료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소아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심각한 생명권 위협이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인프라 속에서 비수도권 지역은 필수의료에서조차 후진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의 근본은 의정 갈등 장기화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에서 기인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지역의 거점 병원들조차 소아전문의 인력 공백으로 인해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다. 전국적으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중 9곳만이,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곳 중 48곳만이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하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이들의 생명’을 방치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강원자치도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강원대 어린이병원 한 곳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는 특정 지역에 모든 부담이 집중된 형태로, 도 전역에 고르게 분산된 응급의료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동해, 강릉, 삼척 등 영동권은 정신응급 공공병상조차 전무한 상태다. 도내 정신의료기관이 49곳에 이르지만, 정작 공공 응급대응 체계는 춘천에만 국한돼 있다. 정신질환 응급환자의 경우 일반 응급환자보다 더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데도, 도민들은 수 시간 거리의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강원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은 소아·정신·야간 진료 등 필수의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적 지원책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중증·응급질환에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전문의 체계’를 지역별로 구축해야 한다. 병상이나 장비가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와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는 의사 유입을 위한 특단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전문의 인건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지방 공공병원 중심의 응급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할 때다.
또한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전담의료기관을 권역별로 지정·육성해야 한다. 의사 한 명이 모든 응급을 책임지는 구조는 지속불가능하다. ‘의료는 곧 안전망’이라는 전제하에, 응급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