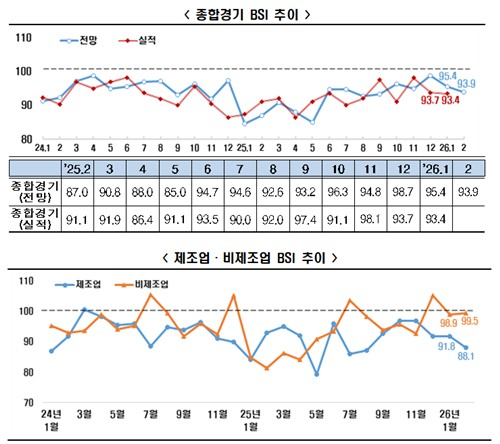지난해 12월부터 올해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카페에 들어서면 메뉴판을 보다 사장에게 “두쫀쿠 있나요?”라는 질문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의례적인 새해 인사 뒤에는 “두쫀쿠 먹어봤어?”, “어디서 샀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두쫀쿠’를 둘러싼 관심은 SNS와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연예인들이 줄 서서 먹는 모습도 보이며 화제성은 더 커졌다. 허니버터칩, 대만식 카스테라, 탕후루에 이어 다시 한 번 디저트 유행이 번지는데 왜 사람들이 두쫀쿠에 열광하는지 궁금증도 함께 따라붙었다.
1개당 6,000원이 훌쩍 넘는 가격, 직접 이슈의 중심인 현장을 확인해보기 위해 강원일보 ‘기자들의 해봤다’ 다섯 번째 시리즈로 두쫀쿠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30일 오후 3시, 춘천 신촌리의 한 카페. 점심시간 이후 비교적 한산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곳에서는 매일 두쫀쿠 약 300개를 만든다. 사장을 포함해 직원 5명이 분업해 작업에 나선다.
두쫀쿠의 기본 재료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볶은 카다이프, 마시멜로, 녹인 버터, 탈지분유, 카카오 파우더 등이다. 원래는 피스타치오 껍질을 직접 까야 하지만, 탈각된 피스타치오 재료인 원물 100%를 푸드 프로세서로 갈아 스프레드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두쫀쿠 속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와 카다이프를 섞은 뒤,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을 퍼 담는 직원처럼 둥근 스쿱으로 10개 이상을 떠 동그랗게 모양을 잡았다. 이후 속 재료는 냉동실로 직행했다.
30여 분이 지나고 마시멜로와 녹인 버터를 약불에서 섞고 탈지분유와 카카오 가루를 더해 겉면이 될 ‘마시멜로 피’를 만들었다. 기계를 이용해 섞자 끈적하고 쫀득한 질감이 완성됐다.
이제 냉동실에서 꺼낸 속을 마시멜로 피로 감싸는 작업만 남았다. 만두를 빚듯 빠른 손놀림이 필요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손끝 탓에 겉면과 속면이 장갑에 달라붙어 한 차례 실패를 겪기도 했다. 쇠똥구리처럼 꾹꾹 눌러 동그랗게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집중력을 요구했다.
고작 10개를 만드는 데도 손가락에 온 신경을 쏟아야 했다. 완성된 두쫀쿠를 카카오 가루에 굴린 뒤, 즉석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맛을 봤다. 꾸덕함과 쫀득함이 동시에 느껴지며 왜 인기를 끄는지 단번에 이해됐다.
이 카페에서는 두쫀쿠를 예약 판매하기보다 선착순이나 유선 예약 방식으로 판매한다. 오전과 오후에 진열대에 올리면 통상 1~2시간 만에 모두 팔린다. 1인 구매 제한도 두지 않아 빠르게 소진된다.
박채영 춘천 신촌리 빵집 카페 사장은 “커피와 빵을 판매하다 두쫀쿠 열풍을 접하고 오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만들기 시작했다”며 “매일 300개를 만들다 보니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작업을 이어갈 때가 많지만 두쫀쿠 덕분에 매출이 2배 이상 늘고 단골손님도 많아져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환하게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