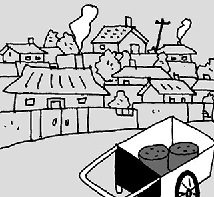
검은 연탄을 굴뚝 밑에 차곡차곡 쌓던 날, 그것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겨울을 버티는 마음의 장작’이었다. 아버지는 손에 그을음을 묻히며 웃었고, 어머니는 군고구마를 꺼내며 말없이 방을 덥혔다. 그 연탄불 아래서 가족은 함께였다.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는 그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세월은 연탄의 온도를 이겨버렸다. 전기보일러와 도시가스가 시대의 효율을 말할 때, 연탄은 낡은 것, 불편한 것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도 품격이 있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 하지 않았던가. 옛것을 익히며 새것을 안다는 말은, 단지 과거를 붙드는 손짓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잃어서는 안 될 ‘체온의 기억’이다. ▼언제부턴가 연탄은 뉴스 속 통계로만 남게 됐다. 연탄사용가구는 2021년 1,062가구에서 2025년 656가구로 5년 새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매년 800~1,000가구를 지원하는 춘천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처럼 소비처가 줄자 강릉의 연탄공장이 올 10월 운영난으로 생산을 중단했고 도내 연탄 공장은 삼척, 태백, 영월 등 단 3곳만 남았다. 전국적으로도 연탄공장은 2014년 46곳에서 올해 17곳으로 감소하며 폐업이 잇따랐다. 이 소식은 단순한 산업의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숨결이 꺼졌다’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연탄은 산업화의 그림자였다. 새벽까지 돌아가던 공장 굴뚝 밑에서, 가난한 이들의 방을 덥히며 대한민국의 겨울을 견뎌냈다. 그러나 그 희미한 불빛이 꺼지는 지금, 우리는 묻는다. 더 따뜻해진 세상에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옛사람들은 불씨를 ‘생명’이라 불렀다. 화로 속 작은 불덩이 하나에도 세대의 삶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다. 연탄불은 단지 방을 데우는 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을 잇고, 이웃을 엮던 사회의 심장이었다. 언젠가 다시 찬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따뜻함이란 전기나 석유의 숫자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숨결로 이어지는 것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