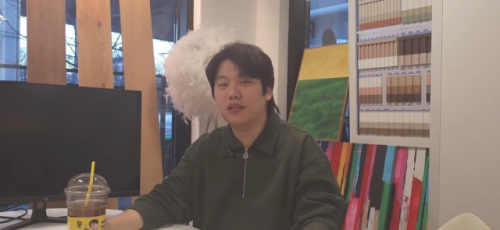새마을금고는 지난 60여 년간 서민금융의 주축으로서 지역경제의 중심에서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국의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실질적인 경제·사회적 공헌을 이어온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 금융기관이다. 이러한 사명을 지탱해온 근간이 바로 비과세 예탁금 제도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조세 감면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소외계층의 자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 기반 마련을 돕는 서민금융정책의 일환이다.
새마을금고는 이 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예수금 운용 기반을 확보 해 왔으며, 고령층,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에게 현실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환원과 공익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앙새마을금고는 매년 순이익의 30%이상을 회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연간 2억 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 예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은 물론 장애인, 아동·청소년복지, 저 출생 극복,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자발적으로 살펴온 공로로 2023년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 진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단순한 세제 감면의 틀을 넘어, 지역 금융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떠받치는 구조적 장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 효과를 다방면에서 창출하고 있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2025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존속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 또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을 단순히 세수확보나 조세 형평성 관점으로만 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만일 제도가 종료된다면,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수익성 위축은 물론 지역사회 환원사업도 축소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력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제 정책의 효율성 중심의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온 지역 중심 공익적 가치, 금융포용성 강화,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 등의 사회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ESG 경영이 국가 차원의 중점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새마을금고의 ESG 실천사례는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지역이 튼튼해야 국가의 균형과 회복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지역과 함께 숨 쉬며 성장해온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있었다.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연장은 지역경제의 회복을 뒷받침 하는 동시에, 전국 곳곳의 지역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국가적 투자이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가치와 효과를 온전히 평가하고,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지역 금융기관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